7. 과거
가. 과장 준비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삼 일만에 환궁(還宮)하사
별단시상(別單施賞) 하신 후에 과거령(科擧令) 내리시니
알성(謁聖)에 용호방(龍虎榜)이 한데로 뵈신다네.
이때는 어느 땐고, 춘삼월(春三月) 호시절(好時節)에
춘풍(春風)이 화려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 하였어라.
금천교(禁川橋) 버들 빛은 벽라만사(碧羅萬絲) 드리운 듯
옥류천(玉流川) 두견(杜鵑) 빛은 홍금천폭(紅錦千幅) 가리운 듯
천자만록(千紫萬綠) 방비(芳菲)하니 가지가지 봄빛이라.
금성유색(金城柳色) 천문효(千門曉)요 옥동도화(玉洞桃花) 만수춘(萬樹春)을
운리제성(雲裏帝城) 쌍봉궐(雙鳳闕)에 우중춘수(雨中春樹) 만인가(萬人家)를
춘당대(春塘臺) 높은 언덕 영화당(映花堂) 넓은 뜰에
배설방(排設房) 군사들과 어군막(御軍幕) 방직(房直)이가
삼층(三層) 보계판(補階板)을 광대(廣大)하게 널리 무고
십칠양(十七樑) 어차일(御遮日)을 반공(半空)에 높이 치고
흰 휘장(揮帳) 둘러치고 다홍공단(茶紅貢緞) 어군막(御軍幕)을
유둔(油芚) 밑에 받쳐 치고 오봉산(五峰山) 일월병풍(日月屛風)
용상(龍床) 위에 교의(交椅) 놓고 용문석(龍紋席) 어포진(御鋪陣)을
광하천간(廣廈千間) 널리 깔고 층층 섬돌 어로(御路)에는
행보석(行步席) 늘어 펴고 뜰 아래 큰 북 놓고
북 위에 안 탑 무고 한편에 향로(香爐) 놓고
색(色)스러운 어사화(御賜花)며 보기 좋은 검은 개(蓋)며
녹의홍상(綠衣紅裳) 무동(舞童)들은 쌍쌍이 늘어섰다.
----------
* 별단(別單):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에 덧붙이던 별도의 문서나 인명부.
* 알성(謁聖): 임금이 성균관 문묘(文廟)의 공자 신위에 참배하던 일.
* 용호방(龍虎榜): 문무과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던 나무판.
* 만화방창(萬化方暢): 따뜻한 봄날에 온갖 생물이 나서 자라 흐드러짐.
* 벽라만사(碧羅萬絲): 푸르고 얇은 비단에 만 가닥 실.
* 홍금천폭(紅錦千幅): 넓은 폭의 붉은 비단,
* 천자만록(千紫萬綠): 붉고 푸른 빛
* 방비(芳菲): 꽃과 풀이 향기롭고 고움.
* 금성유색(金城柳色) 천문효(千門曉): “금성의 버드나무의 색이 푸르니 마을에 동이 터 오고”
* 옥동도화(玉洞桃花) 만수춘(萬樹春): “옥동의 복숭아꽃에는 가지마다 봄이 오누나.”
* 운리제성(雲裏帝城) 쌍봉궐(雙鳳闕): “구름 속 도성에는 한 쌍의 궁궐이”
* 우중춘수(雨中春樹) 만인가(萬人家): “빗속의 봄숲에는 수많은 인가로다.” - 이상은 모두 궁궐에 써 붙인 주련임.
* 배설방(排設房): 궁중 안에서 의식이나 행사를 치를 때 차일이나 자리 등을 차려 놓는 일을 맡아보던 곳.
* 어군막(御軍幕): 임금이 행차 도중에 잠시 머물 수 있게 막을 친 곳,
* 방직(房直): 관아에 딸린 심부름꾼.
* 어차일(御遮日): 임금을 위한 차일,
* 용상(龍床): 임금이 정무를 볼 때 앉던 평상.
* 교의(交椅): 의자.
* 용문석(龍紋席): 용의 무늬를 놓아 짠 돗자리.
* 어포진(御鋪陣): 임금을 위한 바닥에 깔아 놓는 방석.
* 광하천간(廣廈千間): 대궐같이 넓고 큰 집.
* 섬돌: 오르내릴 수 있게 놓은 돌층계.
* 행보석(行步席): 마당에 까는 긴 돗자리.
* 어사화(御賜花): 문무과의 급제자에게 임금이 내리던 종이꽃.
* 개(蓋): 모양이 양산(陽繖)같은 의장(儀仗)의 하나.
* 녹의홍상(綠衣紅裳): 연두저고리에 다홍치마.
* 무동(舞童): 나라 잔치 때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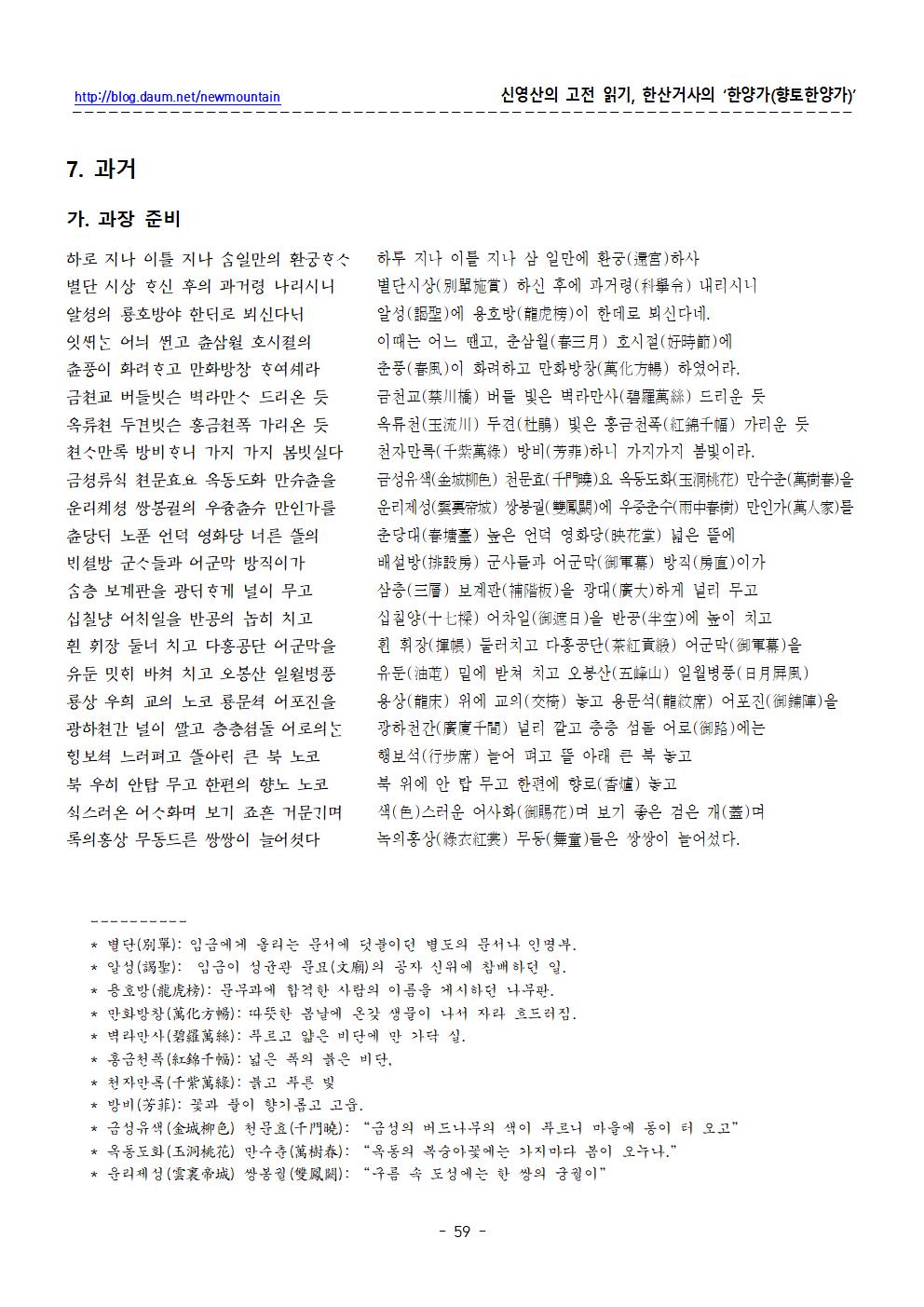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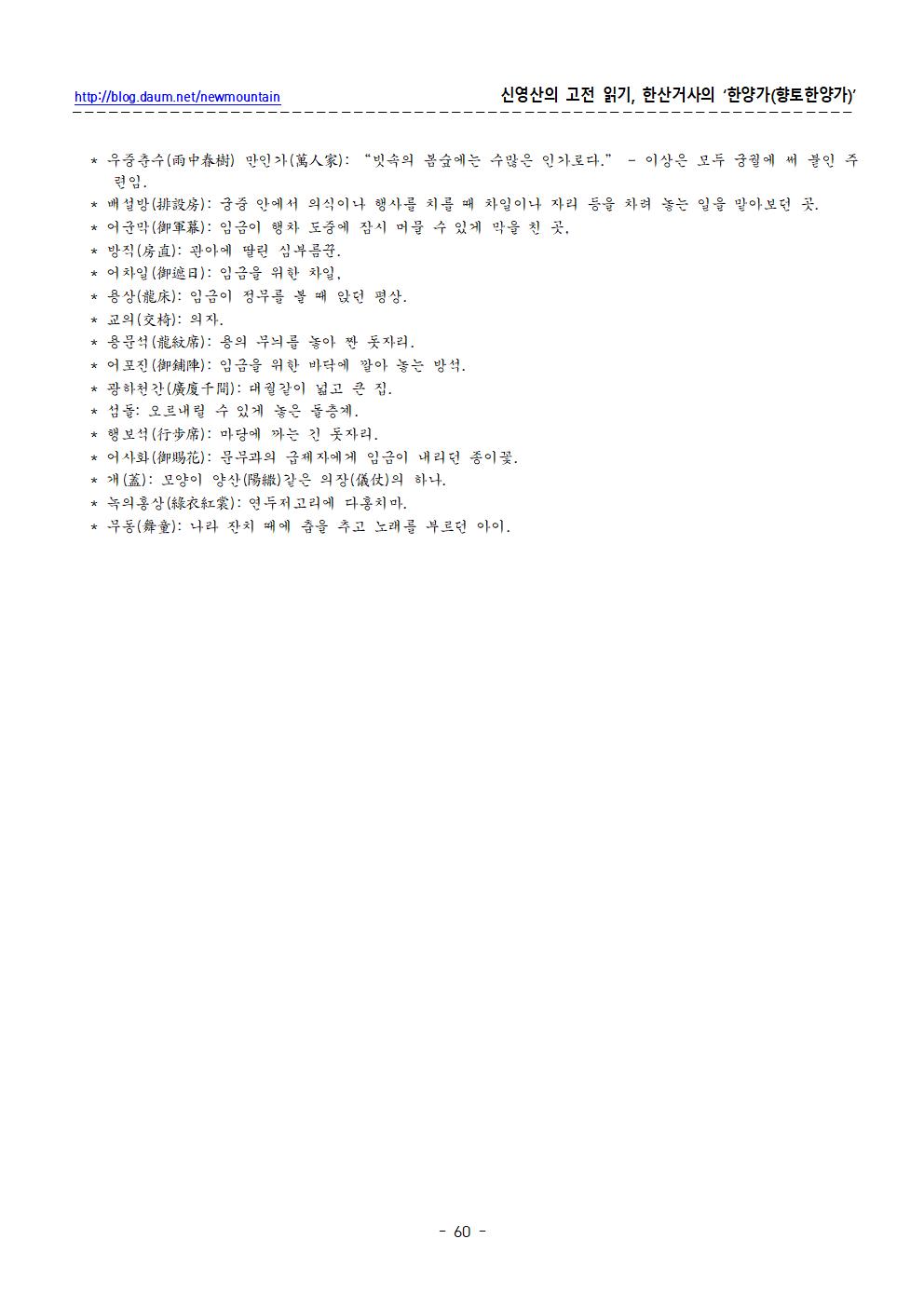
'고전총람(운문) > 풍물한양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양가(한산거사) - 7.과거 _ 다.과거시행 (0) | 2020.10.13 |
|---|---|
| 한양가(한산거사) - 7.과거 _ 나.과장의선비 (0) | 2020.10.13 |
| 한양가(한산거사) - 6.능행 _ 마.능행행차 (0) | 2020.10.12 |
| 한양가(한산거사) - 6.능행 _ 라.능행호위 (0) | 2020.1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