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청운에 오르거든 원한이나 풀어주오
이때 향단이 옥에 갔다 나오더니 저의 아씨 야단 소리에 가슴이 우둔우둔 정신이 울렁울렁 정처 없이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보니 전의 서방님이 와 계시는구나. 어찌 반갑던지 우루룩 들어가서
“향단이 문안이오. 대감님 문안이 어떠하옵시며 대부인 건강은 안녕하옵시며 서방님께서도 먼 길에 평안히 오셨나이까?”
“오냐. 고생이 어떠하냐.”
“소녀 몸을 아무 탈이 없사옵니다. 아씨 아씨, 큰아씨. 마오 마오, 그리 마오. 멀고 먼 천리 길에 뉘 보려고 와 계시기에 이 괄시가 웬일이오. 애기씨가 알으시면 지레 야단이 날 것이니 너무 괄시 마옵소서.”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먹던 밥에 풋고추 저리김치 양념 넣고 단간장에 냉수 가득 떠서 모난 쟁반에 받쳐 드리면서
“더운 진지 할 동안에 시장하신데 우선 시장기가 조금 면하옵소서.”
“밥아 너 본 지 오래로구나.”
어사또 반겨하며,
“밥아 너 본지 오래로구나.”
여러가지를 한데다가 붓더니 숟가락 댈 것 없이 손으로 뒤져서 한편으로 몰아치더니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하는구나.
춘향 모 하는 말이
“얼씨구 밥 빌어먹기는 이골이 났구나.”
이때 향단이는 저의 애기씨 신세를 생각하여 크게 울지는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며 하는 말이,
“어찌할거나, 어찌할꺼나. 도덕 높은 우리 애기씨 어찌하여 살리시려오. 어찌꺼나요, 어찌꺼나요.”
실성으로 우는 양을 어사또 보시더니 기가 막혀
“여봐라 향단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너의 아기씨가 설마 살지 죽을쏘냐. 행실이 지극하면 사는 날이 있느니라.”
춘향 모 듣더니
“애고 양반이라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은 있어서 대체 자네가 왜 저 모양인가?”
향단이 하는 말이
“우리 큰아씨 하는 말을 조금도 마음에 담아 두지 마옵소서. 나이 많아 늙어 망령든 중에 이 일을 당해 놓으니 홧김에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화내리까. 더운 진지 잡수시오.”
어사또 밥상 받고 생각하니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하여 마음이 울적, 오장이 울렁울렁 저녁밥이 맛이 없어
“향단아. 상 물려라.”
담뱃대 투툭 털며
“여보소, 장모. 춘향이나 좀 보아야지.”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리까.”
향단이 여쭈오되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파루 치거든 가사이다.”
이때 마침 파루를 뎅뎅 치는구나. 향단이는 미음상 이고 등롱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 앞에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고 옥사쟁이도 간 곳 없네. 이때 춘향이 깊이 잠들지도 못하고 깨지도 않은 어렴풋할 때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이요, 몸에는 홍삼이라. 그리워하는 상사 한결같은 마음에 목을 안고 갖가지 정과 회포에 젖어 있던 차라.·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 있을쏘냐.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 보소.”
“모르는 말씀이오. 예서 동헌이 마주치는데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 형편을 살펴볼 것이니 잠깐 멈추옵소서.”
“무에 어때, 염문이 무엇인고. 내가 부를 게 가만있소.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며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다.”
어사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하여 쓸개가 떨어질 것이니 가만히 계옵소서.”
춘향이 저의 모친 목소리 듣고 깜짝 놀라
“어머니 어찌 오셨소. 몹쓸 딸자식을 생각하여 함부로 날뛰는 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치기 쉽소. 이 다음이랑은 오시지 마옵소서.”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오다니 뉘가 와요.”
“그저 왔다.”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 주오. 꿈 가운데 임을 만나 갖가지 정과 회포에 젖어 있었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식 왔소. 벼슬 띠고 내려온단 노문이 왔소. 답답하여라.”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가 내려왔다.”
“허허. 이게 왠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꿈속에 보던 임을 깨어서 본단 말인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갑자기 숨이 멎으며,
“애고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해 그린 임을 이리 수이 만날 손가.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팔자가 사납구나,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우나 임 그리워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 갈수록 한이더니, 내 신세 이리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는 날 살리려 와 계시오.”
한참 이리 반기다가 임의 모습 자세히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랴.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설운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 이 형편이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설워 마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는데 설마한들 죽을쏘냐.”
춘향이 저의 모친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 큰 가뭄에 지친 백성들이 비를 기다린들 나와 같이 애를 태워 목숨이 저절로 끊어질 지경에 이르던가. 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한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입던 비단 장옷 봉장 안에 들었으니, 그 옷 내어 팔아다가 한산 모시 바꾸어서 색깔 곱게 도포 짓고 올이 고운 비단 긴 치마를 되는 대로 팔아다가 관, 망건, 신발 사드리고 절병은비녀, 밀화장도, 옥가락지가 함 속에 들었으니 그것도 팔아다가 한삼, 고의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오. 머지않아 죽을 년이 세간 두어 무엇할까. 용장, 봉장, 서랍장을 되는 대로 팔아다가 특별한 반찬으로 진지 대접하오. 나 죽은 후에라도 나 없다 마시고 날 본 듯이 섬기소서.
서방님, 내 말씀 들으시오. 내일이 본관 사또 생신이라. 술 취한 중에 술주정 나면 나를 올려 칠 것이니 형문 맞은 다리 장독이 났으니 손발인들 놀릴쏜가. 구름같이 드리워진 쪽 찐 머리 흐트러진 머리 이렁저렁 걷어 얹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곤장 맞아 죽거들랑, 삯꾼인 체 달려들어 둘러업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의 적막하고 고요하고 적적한 데 뉘어 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가,
서방님 귀하게 되어 벼슬길에 오르거든, 잠시도 두지 말고 육진장포로 다시 염습하여 조촐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으로 찾아갈 제, 앞 남산 뒷 남산 다 버리고 한양성으로 올려다가 선산 발치에 묻어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춘향지묘’라 여덟 자만 새겨 주오.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 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가슴에 맺힌 원한이나 풀어 주오. 애고 애고, 내 신세야.
불쌍한 나의 모친 나를 잃고 집안 살림 탕진하면 하릴없이 걸인 되어 이집 저집 빌어먹다가 언덕 밑에 조속조속 졸면서 자진하여 죽게 되면, 지리산 갈까마귀 두 날개를 떡 벌리고 둥덩실 날아들어 까옥까옥 두 눈을 다 파먹은들 어느 자식 있어 후여 하고 날려 주리.”
애고 애고, 섧게 울 제,
어사또,
“울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네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듯이 설워하느냐?.”
작별하고 춘향 집에 돌아왔지.
춘향이는 어둠침침 깊은 밤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 옥방에 홀로 앉아 탄식하는 말이
“밝은 하늘은 사람을 낼 제 별로 후하고 박함이 없건마는 나의 신세 무슨 죄로 이팔청춘에 임 보내고 모진 목숨 살아 이 형문 이 곤장이 무슨 일인고. 옥중 고생 서너 달에 밤낮없이 임 오시기만 바라더니, 이제는 임의 얼굴 보았으니 희망 없이 되었구나. 죽어 저승에 돌아간들 제왕전에 무슨 말을 자랑하리.”
애고 애고, 설이 울 제 목숨이 다하여 반은 살고 반은 죽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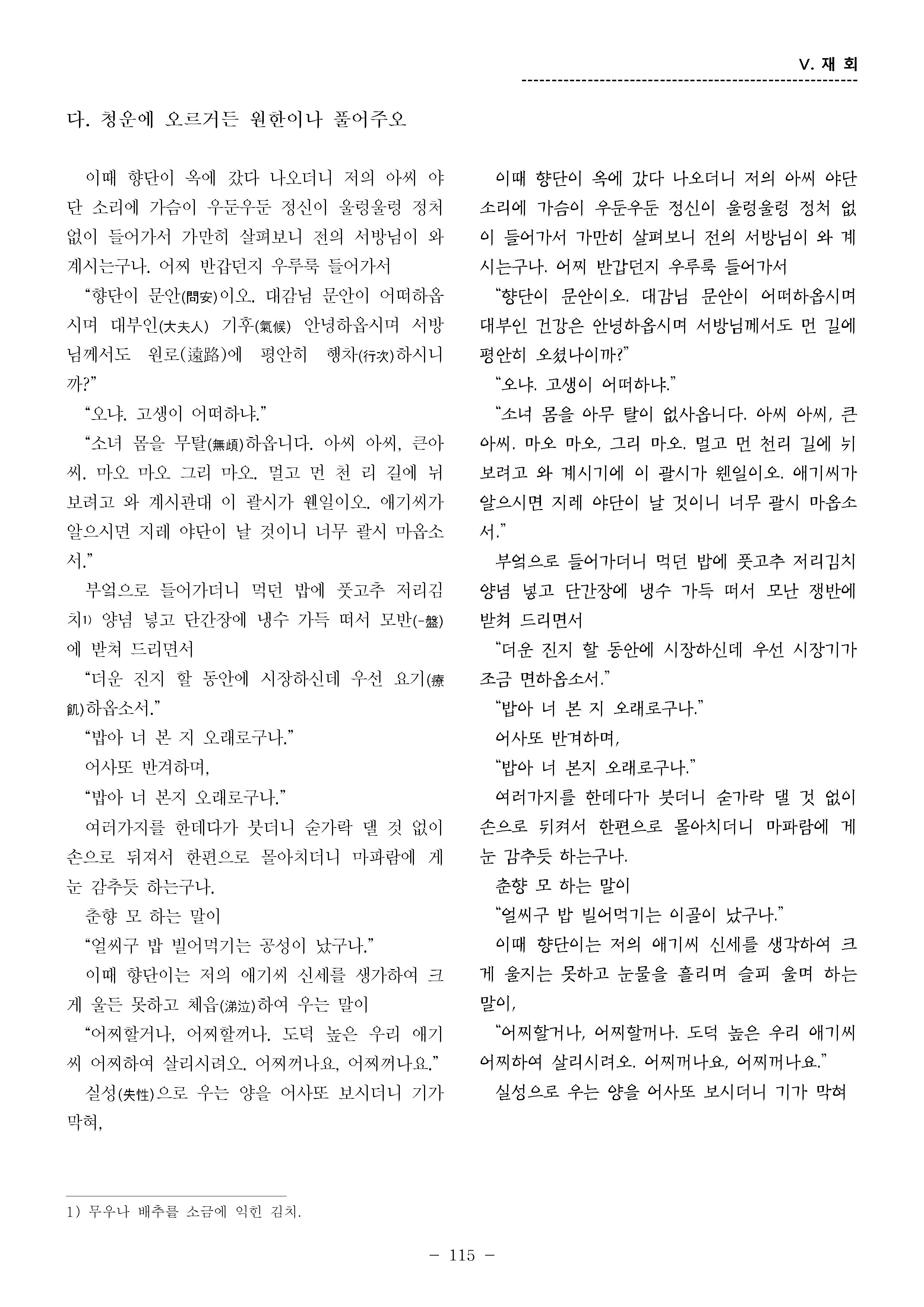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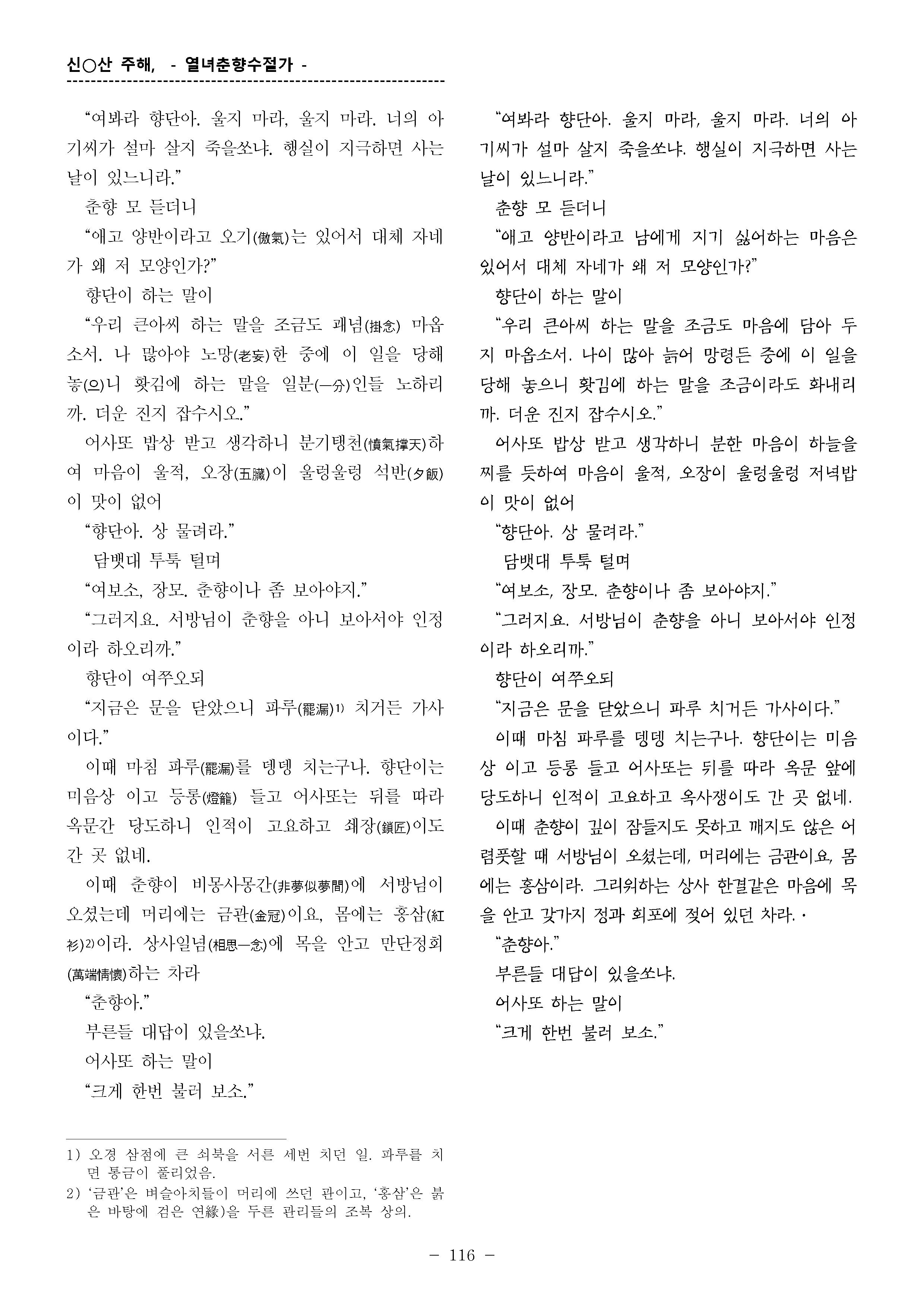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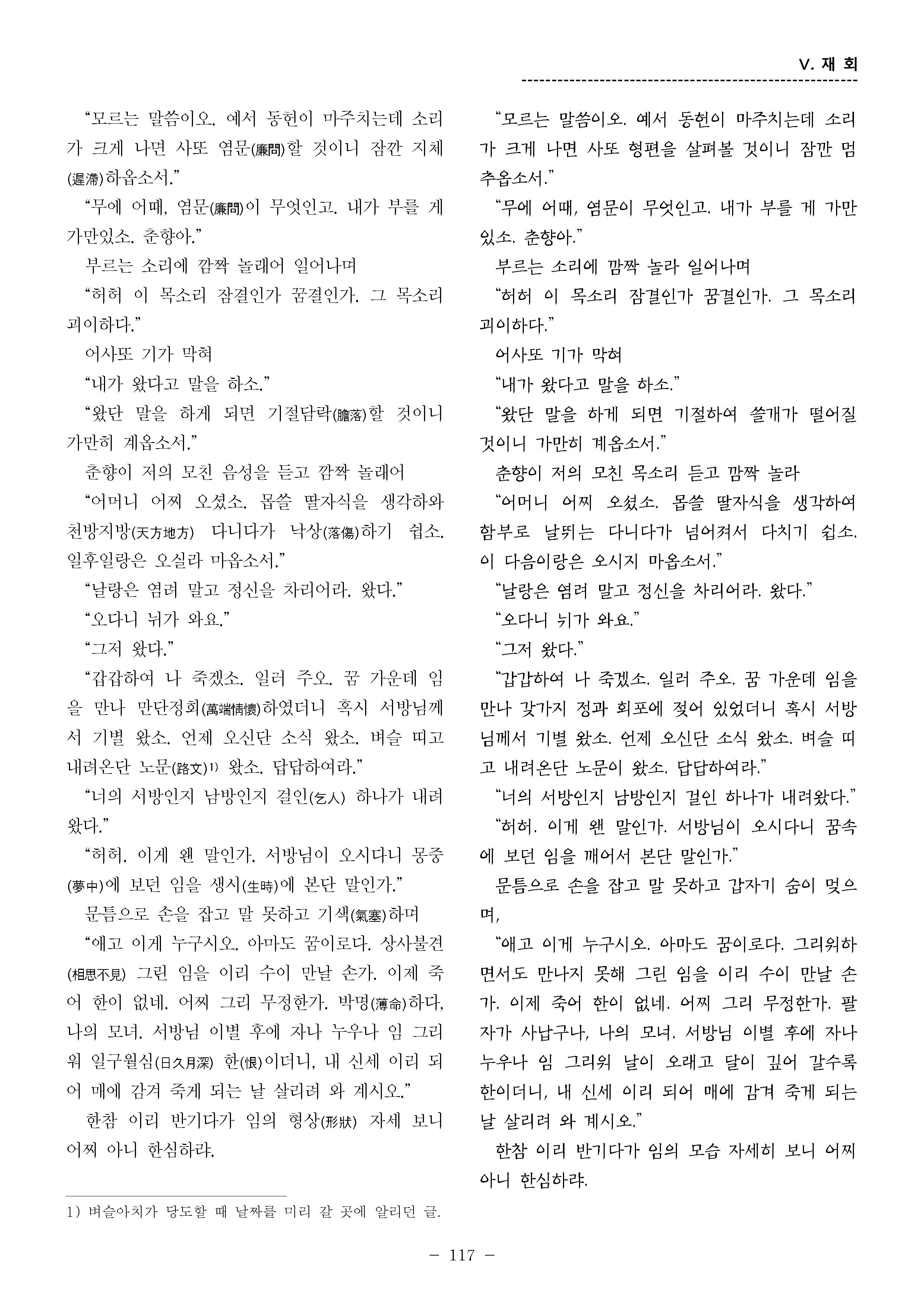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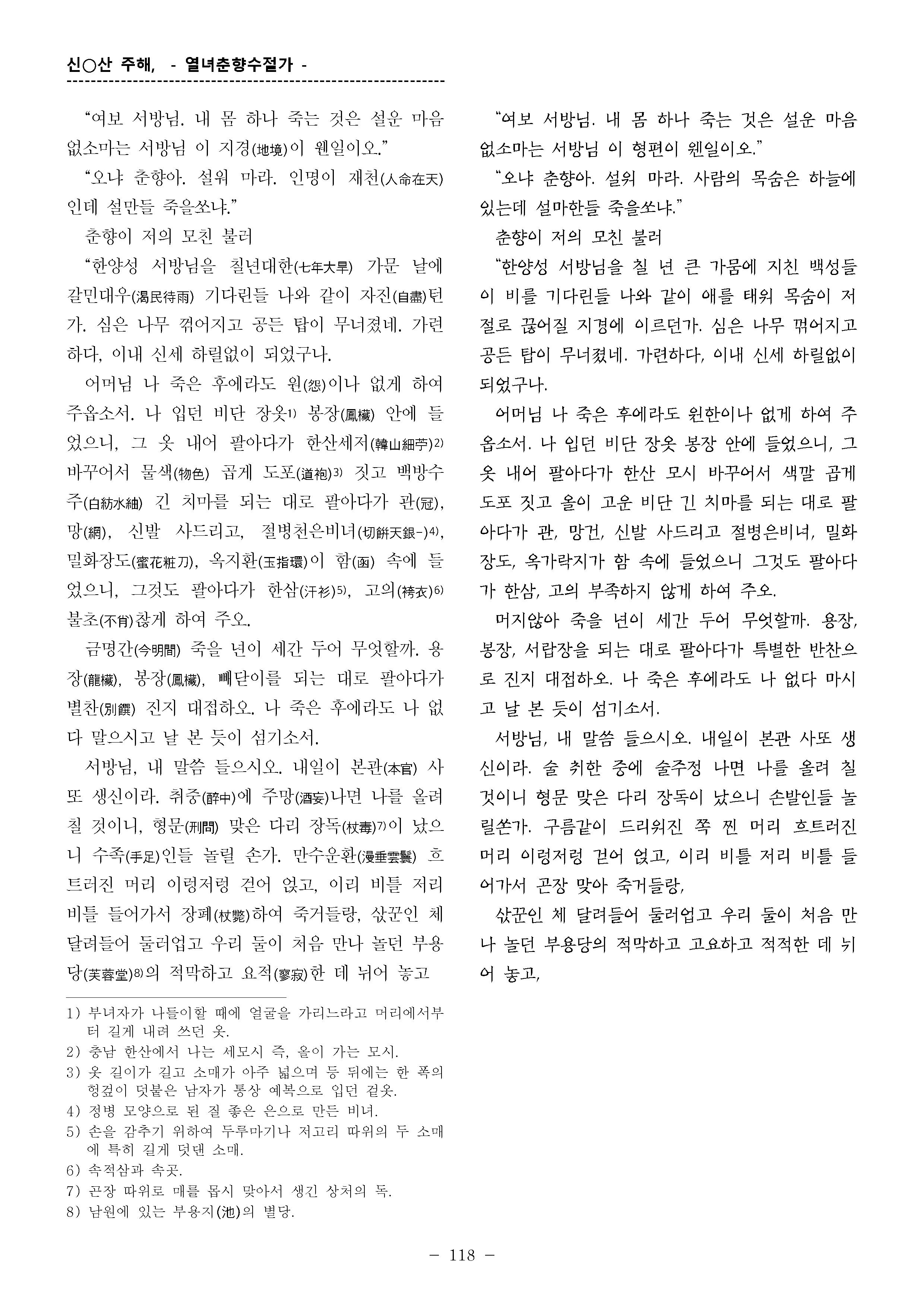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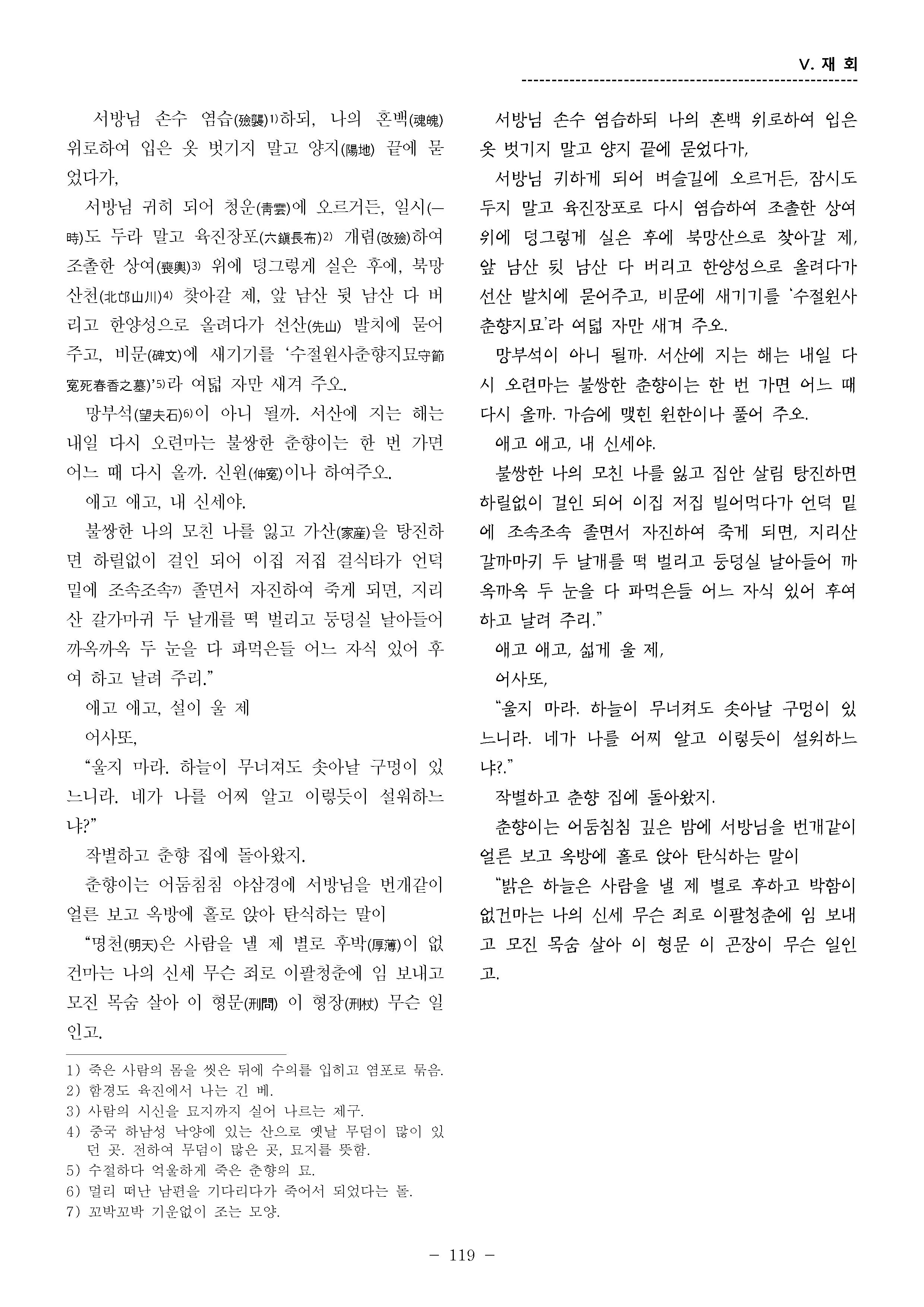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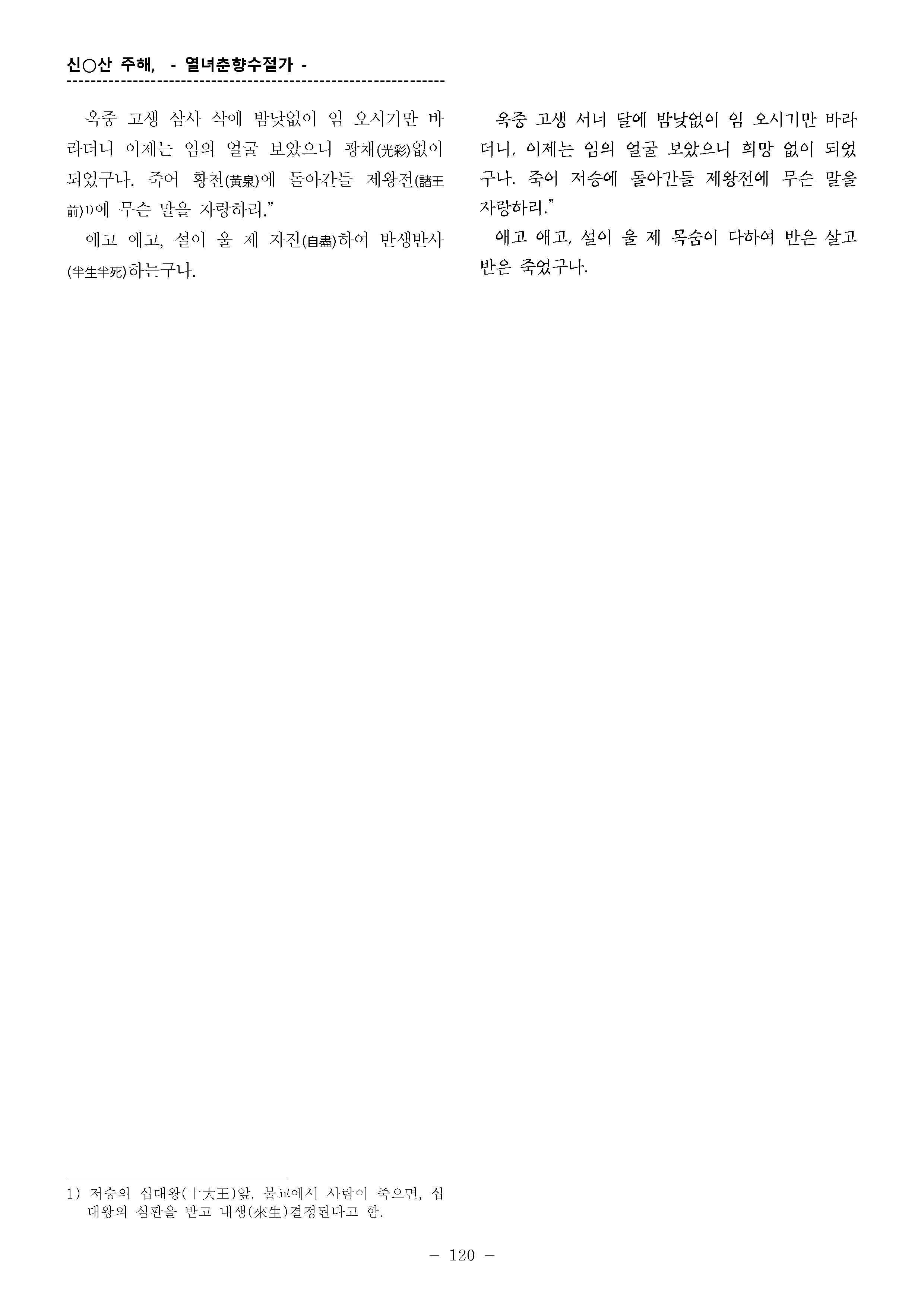
'고전총람(산문) > 열녀춘향수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완판)열녀춘향수절가 - V. 재회 (5/5) (0) | 2020.07.03 |
|---|---|
| (완판)열녀춘향수절가 - V. 재회 (4/5) (0) | 2020.07.03 |
| (완판)열녀춘향수절가 - V. 재회 (2/5) (0) | 2020.07.03 |
| (완판)열녀춘향수절가 - V. 재회 (1/5) (0) | 2020.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