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또가 모질더라 이도령이 무정터라
한참 이러할 제 한 농부 썩 나서며
“담배 먹세. 담배 먹세.”
갈멍덕 숙여 쓰고 두던에 나오더니 곱돌조대 넌짓 들어 꽁무니 더듬더니 가죽 쌈지 빼어 놓고 세차게 침을 뱉어 엄지손가락이 자빠지게 비비적비비적 단단히 넣어 짚불을 뒤져 놓고, 화로에 푹 찔러 담배를 먹는데 농군이라 하는 것이 담뱃대가 빡빡하면 쥐새끼 소리가 나것다. 양 볼때기가 오목오목 콧구멍이 발심발심 연기가 홀홀 나게 피워 물고 나서니 어사또 반말하기는 이골이 났지.
“저 농부 말 좀 물어보면 좋겠구먼.”
“무슨 말.”
“이 고을 춘향이가 본관에 수청들어 뇌물을 많이 먹고 백성들 다스리는 일에 큰 폐단이 된단 말이 옳은지.”
저 농부 열을 내어
“게가 어디 사나?”
“아무 데 살든지.”
“아무 데 살든지라니. 게는 눈구멍 귓구멍이 없나. 지금 춘향이를 수청 아니든다 하고 형장 맞고 갇혔으니, 기생집에 그런 열녀 세상에 드문지라. 옥결 같은 춘향 몸에 자네 같은 동냥치가 더럽고 추한 말을 을 시키다간 빌어먹지도 못하고 굶어 뒤어지리. 올라간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그놈의 자식은 한번 가버린 후 소식이 없으니 사람 일을 그렇고는 벼슬은커녕 내 좆도 못하지.”
“어 그게 무슨 말인고?”
“왜. 어찌 되나.”
“되기야 어찌 되랴마는 남의 말로 말버릇을 너무 고약히 하는고.”
“자네가 철모르는 말을 하매 그렇지.”
수작을 파하고 돌아서며
“허허 망신이로고. 자 농부네들 일 하오.”
“예.”
하직하고 한 모롱이를 돌아드니 아이 하나 오는데, 지팡이 막대 끌면서 시조 절반 사설 절반 섞어 하되,
“오늘이 며칠인고. 천릿길 한양성을 며칠 걸어 올라가랴. 조자룡이 강을 뛰어넘던 청총마가 있었다면 금일로 가련마는, 불쌍하다, 춘향이는 이서방을 생각하여 옥중에 갇히어서 금방 숨이 끊어질 듯하니 불쌍하다. 몹쓸 양반 이서방은 한 번 간 뒤에 소식이 끊어지니 양반의 도리는 그러한가.”
어사또 그 말 듣고
“이 애. 어디 있니?”
“남원읍에 사오.”
“어디를 가니?”
“서울 가오.”
“무슨 일로 가니?”
“춘향의 편지 갖고 옛 사또댁에 가오.”
“이 애. 그 편지 좀 보자꾸나.”
“그 양반 철모르는 양반이네.”
“웬 소린고.”
“글쎄 들어보오. 남아 편지 보기도 어렵거든 하물며 남의 아녀자의 편지를 보자는 말이오.”
“이 애 들어라. 길 가는 사람 떠나려 함에, 다시 또 뜯어본다는 말이 있느니라. 좀 보면 관계하랴.”
“그 양반 몰골은 흉악하구만 문자 속은 기특하오. 얼른 보고 주오.”
“호로자식이로고.”
편지 받아 떼어 보니 사연에 하였으되
한 번 이별 후 소식이 오랫동안 막히니, 도련님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면서 살아가는 형편이 다 편안하옵신지 간절히 원하며 공손히 사모하옵니다.
천한 계집 춘향은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혀 관가로부터 재앙을 만나 일이 크게 잘못되어 금방 숨이 끊어질 듯한지라. 죽을 지경에 이르러 혼이 황릉묘로 날아가고, 혼이 귀문관으로 드나드니, 이 몸이 비록 죽을 수밖에 없으나, 단지 두 지아비를 바꿀 수 없음이요, 첩이 죽고 사는 것과 늙은 어미의 모습이 어떤 지경에 이를지 알지 못하오니 서방님 깊이 헤아려 처리하옵소서.“
편지 끝에 하였으되,
지난해 어느 때에 임이 첩과 이별했던고,
어제 이미 겨울눈이 내렸는데 또 가을이 왔구나.
미친바람 깊은 밤에 눈물이 눈 같으니
어느 때나 남원 옥중의 죄수가 되었는고.
혈서로 하였는데 바닷가 모래밭에 앉은 기러기 격으로 그저 툭툭 찍은 것이 모두 다 애고로다. 어사 보더니 두 눈에 눈물이 떨어지거니 맺거니 방울방울 떨어지니 저 아이 하는 말이,
“남의 편지 보고 왜 우시오.”
“어따 이 애. 남의 편지라도 설운 사연을 보니 자연 눈물이 나는구나.”
“여보 인정 있는 체하고 남의 편지 눈물 묻어 찢어지오. 그 편지 한 장 값이 열닷 냥이오. 편지 값 물어내오.”
“여봐라. 이도령이 나와 어렸을 때부터 가까운 친구로서 먼 시골에 볼 일이 있어 나와 함께 내려오다 완영에 들렸으니 내일 남원으로 만나자 언약하였다. 나를 따라 가 있다가 그 양반을 뵈어라.”
그 아이 반색하며
“서울을 저 건너로 아시오?”
하며 달려들어
“편지 내오.”
서로 버티려 할 제 옷 앞자락을 잡고 실랑이하며 살펴보니 명주 전대를 허리에 둘렀는데, 제사 그릇 접시 같은 것이 들었거늘 물러나며,
“이것 어디서 났소. 찬바람이 나오.”
“이놈 만일 중대한 비밀이 새어나갔다가는 생명을 보전치 못하리라.”
당부하고 남원으로 들어올 제 박석치를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산도 예 보던 산이요, 물도 예 보던 물이라. 남문 밖 썩 내달아,
“광한루야 잘 있더냐. 오작교야 무사하냐.”
객사의 푸른 버들색이 새로운 데는 나귀 매고 놀던 데요, 푸른 구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은 내 발 씻던 맑은 계곡물이라. 푸른 나무가 늘어서 있는 넓은 길은 서울로 왕래하는 옛길이라.
오작교 다리 밑에 빨래하는 여인들은 계집아이 섞여 앉아
“야야.”
“왜야.”
“애고 애고, 불쌍하더라. 춘향이가 불쌍하더라. 모질더라, 모질더라. 우리 고을 사또가 모질더라. 절개 높은 춘향이를 위력으로 겁탈하려 한들 철석 같은 춘향 마음 죽는 것을 헤아릴까. 무정하더라, 무정하더라. 이도령이 무정하더라.”
저희끼리 모여 이야기하며 추적추적 빨래하는 모양은 영양공주, 난양공주, 진채봉, 계섬월, 백릉파, 적경홍, 심요연, 가춘운도 같다마는 양소유가 없었으니 뉘를 찾아 앉았는고.
어사또 누에 올라 자세히 살펴보니, 석양은 서쪽에 있고 잠들 새는 숲속에 들 제, 저 건너 버드나무는 우리 춘향 그네 매고 오락가락 놀던 양을 어제 본 듯 반갑도다. 동편을 바라보니 긴 숲 깊은 곳에 푸른 나무 사이에 춘향 집이 저기로다. 저 안의 담 안에 있는 동산은 예 보던 모습 그대로이요, 돌벽의 험한 옥은 우리 춘향 우니는 듯 불쌍하고 가엾구나.
해가 서산으로 떨어지는 황혼 무렵에 춘향의 문 앞에 다다르니 행랑은 무너지고 몸채는 껍데기를 벗었는데, 옛날 보던 벽오동은 수풀 속에 우뚝 서서 바람을 못 이기어 추레하게 서 있거늘, 낮은 담장 밑에 백두루미는 함부로 다니다가 개한테 물렸는지 깃도 빠지고 다리를 징금 끼룩 뚜루룩 울음 울고, 빗장 앞의 누렁개는 기운없이 졸다가 오래 알던 얼굴을 몰라보고 꽝꽝 짖고 내달으니,
“요 개야, 짖지 마라. 주인 같은 손님이다. 너의 주인 어디 가고 네가 나와 반기느냐.”
중문을 바라보니 내 손으로 쓴 글자가 충성 충자 뚜렷하더니 가운데 중 자는 어디 가고 마음 심 자만 남아 있고, 용과같이 힘있게 썼던 입춘 글씨는 동남풍에 펄렁펄렁 이내 수심 도와낸다.
그렁저렁 들어가니 안뜰은 적막한데 춘향의 모 거동 보소. 미음 솥에 불 넣으며
“애고 애고, 내 일이야. 모질도다, 모질도다. 이서방이 모질도다. 위태한 지경 내 딸 아주 잊어 소식조차 끊어졌네. 애고 애고, 설운지고. 향단아 이리와 불 넣어라.”
하고 나오더니 울 안의 개울물에 흰 머리 감아 빗고 정화수 한 동이를 단 아래에 받쳐 놓고 땅에 엎드려서 소원을 빌되,
“하늘과 땅의 신들, 해와 달과 별은 한마음으로 도와주소서. 다만 독녀 춘향이를 금쪽같이 길러내어 외손자에게 제사 바라더니 무죄한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혔으니 살릴 길이 없삽니다. 하늘과 땅의 신들은 감동하사 한양성 이몽룡을 높은 벼슬에 높이 올려 내 딸 춘향 살려지이다.”
빌기를 다한 후
“향단아 담배 한 대 붙여 다오.”
춘향의 모 받아 물고 후유 한숨 눈물 질새, 이때 어사 춘향 모 정성 보고
“내가 벼슬한 게 조상님의 숨은 덕행으로 알았더니 우리 장모 덕이로다.”
하고
“그 안에 뉘 있나.”
“뉘시오.”
“내로세.”
“내라니 뉘신가.”
어사 들어가며
“이서방일세.”
“이서방이라니. 옳지 이풍헌 아들 이서방인가.”
“허허 장모 망령이로세. 나를 몰라, 나를 몰라.”
“자네가 뉘기여.”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 하였으니 어찌 나를 모르는가.”
춘향의 모 반겨하여
“애고 애고, 이게 웬일인고. 어디 갔다 이제 와. 바람이 크게 일더니만, 바람결에 풍겨 온가. 여름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에 가득하여니 구름 속에 싸여 온가. 춘향의 소식 듣고 살리려고 와 계신가. 어서 어서 들어가세.”
손을 잡고 들어가서 촛불 앞에 앉혀 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걸인 중에는 상걸인이 되었구나. 춘향의 모 기가 막혀
“이게 웬일이오.”
“양반이 그릇되매 말로 나타낼 수 없네. 그때 올라가서 벼슬길 끊어지고 집안의 재산을 다 써서 없애고 부친께서는 학장질 가시고 모친은 친가로 가시고 다 각기 갈리어서 나는 춘향에게 내려와서 돈 천이나 얻어 갈까 하였더니 와서 보니 양쪽 집의 내려 말 아닐세.”
춘향의 모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무정한 이 사람아. 한 번 이별 후로 소식이 없었으니 그런 사람의 일이 있으며, 뒷날 출세하기 바랐더니 이리 잘 되었소. 쏘아 논 화살이 되고 엎질러진 물이 되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마는 내 딸 춘향 어쩔라나?”
홧김에 달려들어 코를 물어 뗄려 하니
“내 탓이지 코 탓인가. 장모가 나를 몰라보네. 하늘이 무심하다 해도 비와 구름의 조화와 천둥소리와 벼락의 기운은 있느니.”
춘향 모 기가 차서
“양반이 그릇되매 간사하게 농락하는 버릇조차 들었구나.”
어사 짐짓 춘향 모가 하는 거동을 보려 하고
“시장하여 나 죽겠네. 나 밥 한 술 주소.”
춘향 모 밥 달라는 말을 듣고
“밥 없네.”
어찌 밥 없을까마는 홧김에 하는 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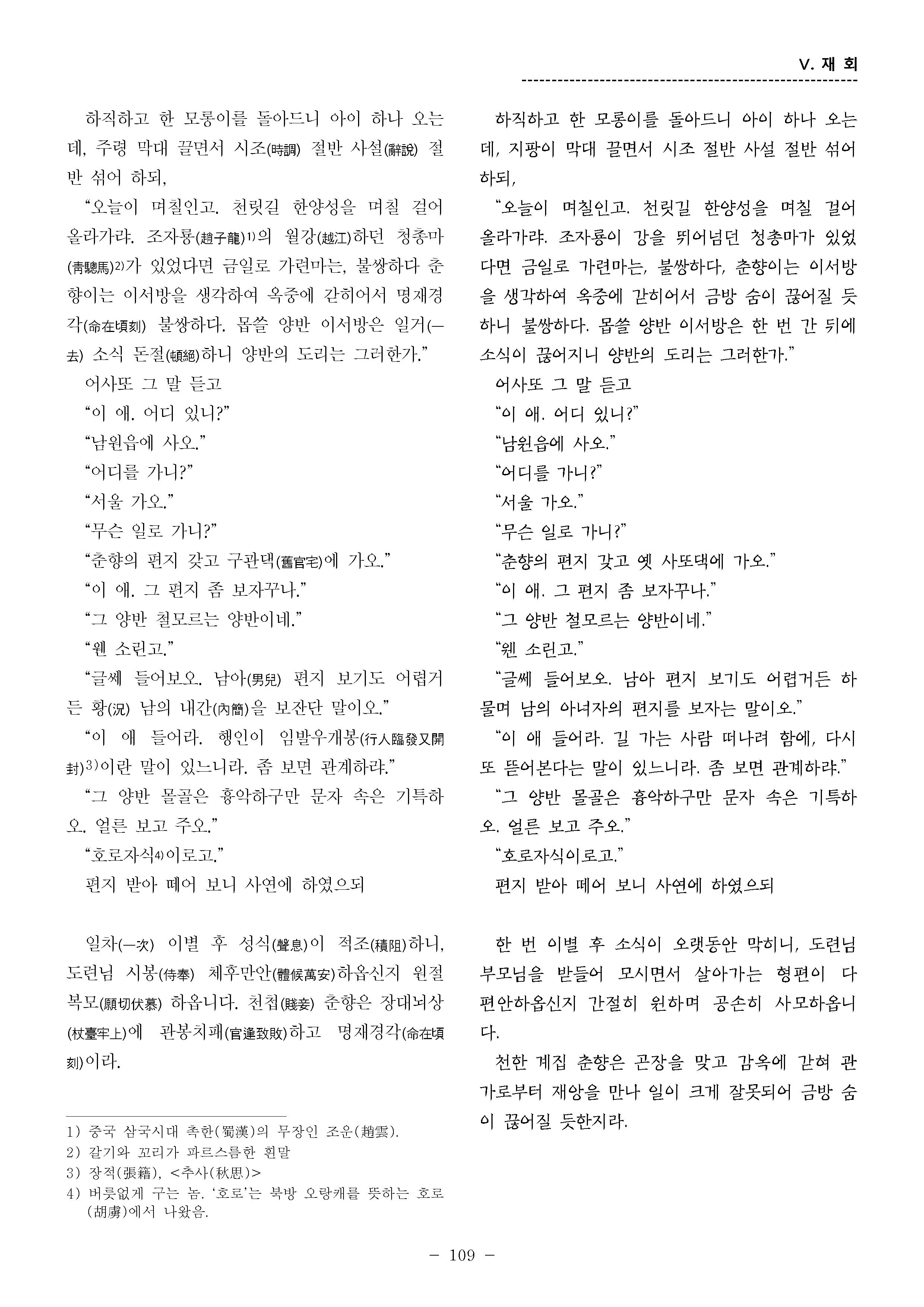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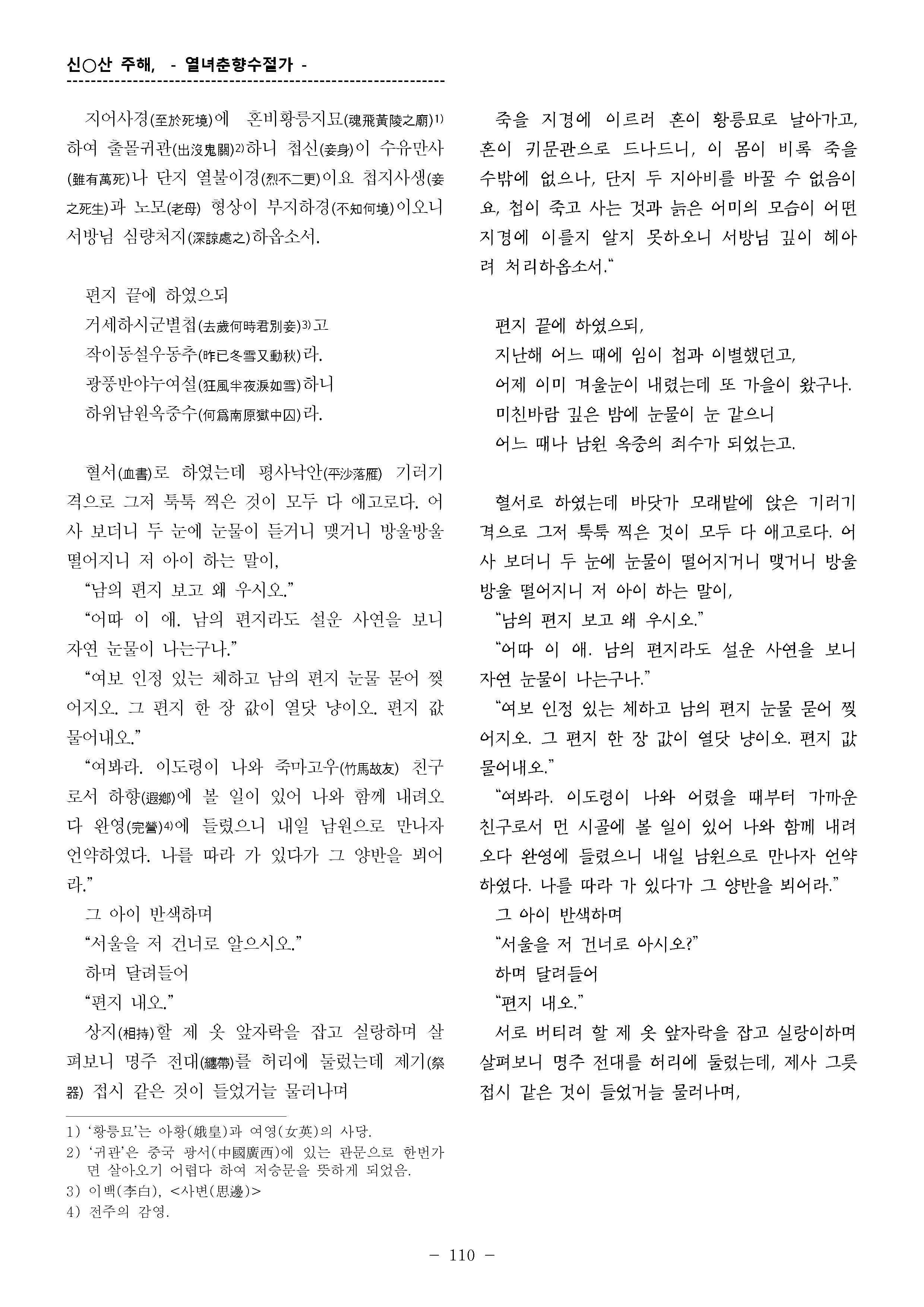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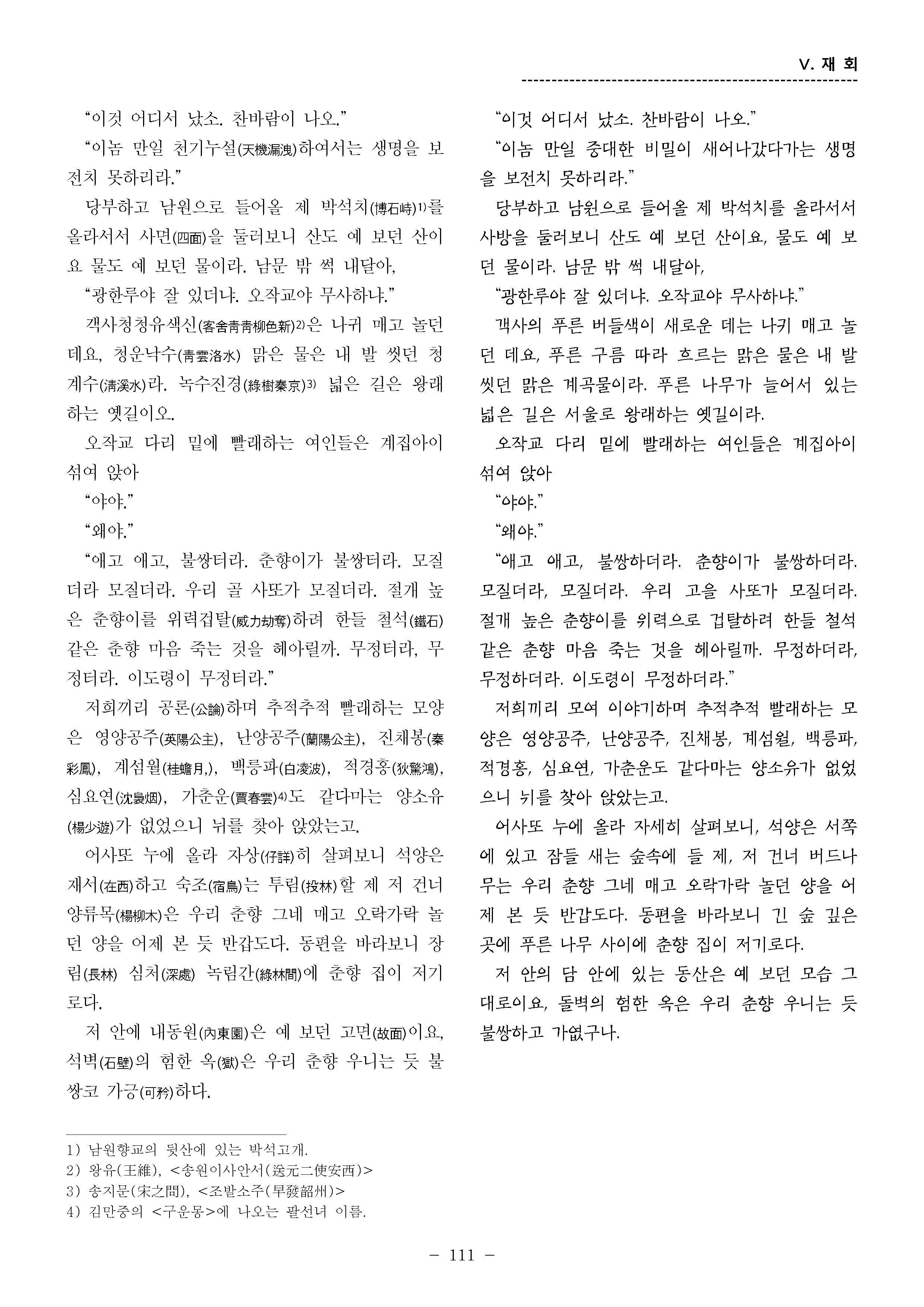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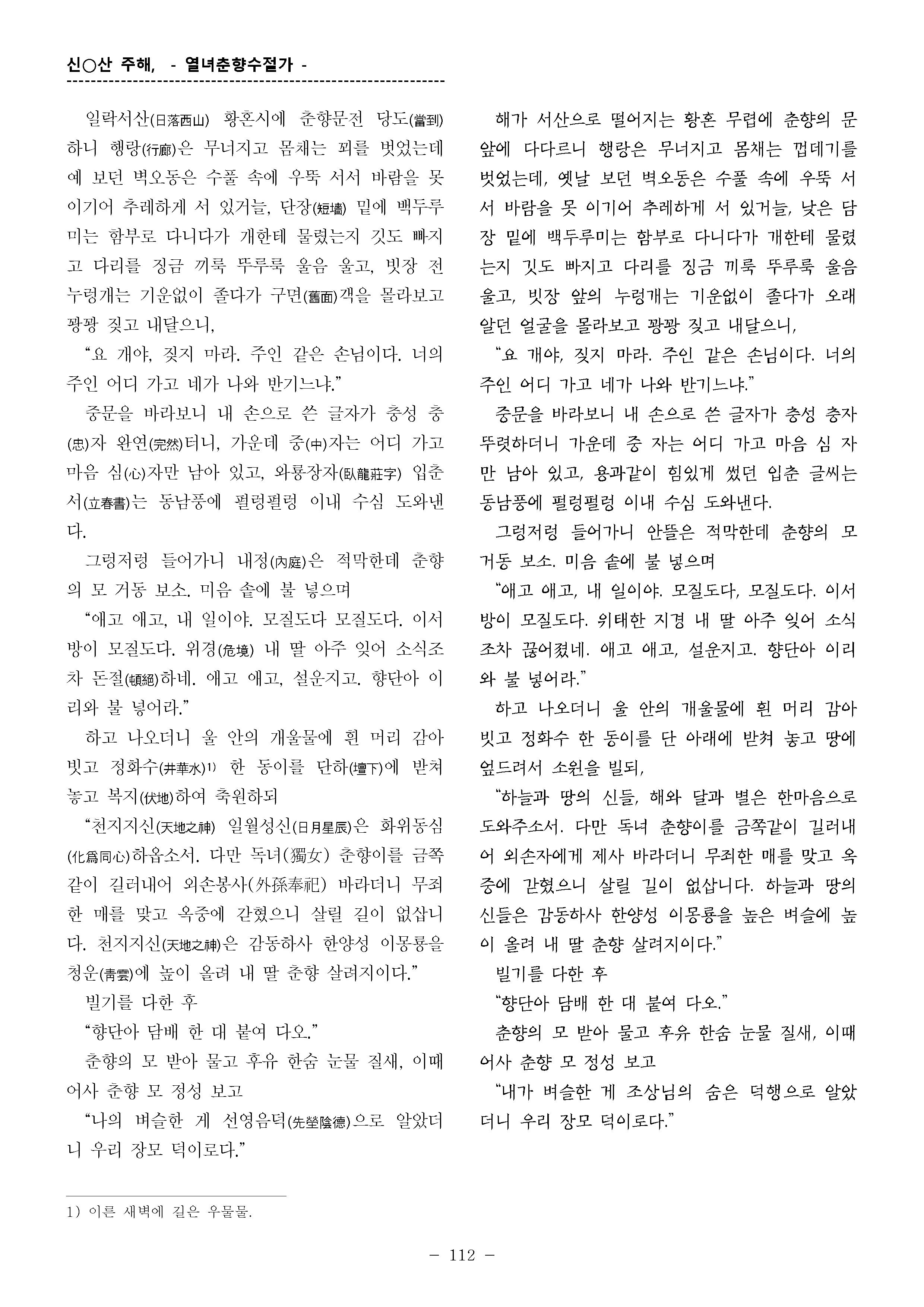


'고전총람(산문) > 열녀춘향수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완판)열녀춘향수절가 - V. 재회 (4/5) (0) | 2020.07.03 |
|---|---|
| (완판)열녀춘향수절가 - V. 재회 (3/5) (0) | 2020.07.03 |
| (완판)열녀춘향수절가 - V. 재회 (1/5) (0) | 2020.07.03 |
| (완판)열녀춘향수절가 - IV. 시련 (5/5) (0) | 2020.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