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이별
가. 만번이나 맹세키로 내 정녕 믿었더니,
이때 뜻밖에 방자 나와
“도련님. 사또께옵서 부르시오.”
도련님 들어가니 사또 말씀하시되
“여봐라 서울서 동부승지 교지가 내려왔다. 나는 문서와 장부를 조사하고 처리하고 갈 것이니, 너는 어머님을 모시어서 내일로 떠나거라.”
도련님 아버지 명을 듣고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 춘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여 사지에 맥이 풀리고 간장이 녹는 듯, 두 눈으로 더운 눈물이 펄펄 솟아 옥 같은 얼굴을 적시거늘.
사또 보시고,
“너 왜 우느냐? 내가 남원을 일생 살 줄로 알았더냐. 조정 안으로 승진되니 섭섭히 생각 말고 금일부터 행장을 꾸리고 절차를 급히 차려 내일 오전으로 떠나거라.”
겨우 대답하고 물러 나와 관아 내로 들어가 사람이 위 아랫사람을 막론하고 모친께는 허물이 작은지라. 춘향의 말을 울며 청하다가 꾸중만 실컷 듣고 춘향의 집을 나오는데, 설움은 기가 막히나 길에서 울 수 없어 참고 나오는데 속에서 두부찌개 끓듯하는지라. 춘향의 문 앞에 당도하니, 통째, 건더기째, 보시기째 왈칵 쏟아져 놓으니,
“어, 푸어, 푸어, 허.”
춘향이 깜짝 놀라 왈칵 뛰어 내달아
“애고 이게 웬일이오.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꾸중을 들으셨소. 길에서 오시다가 무슨 분함 당하여 계시오. 서울서 무슨 기별이 왔다더니 상복을 입을 일이 있어 계시오. 점잖으신 도련님이 이것이 웬일이오.”
춘향이 도련님 목을 담쏙 안고 치맛자락을 걷어잡고 옥 같은 얼굴에 흐르는 눈물 이리 씻고 저리 씻으면서,
“울지 마오. 울지 마오.”
도련님 기가 막혀 울음이란 게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더 울던 것이었다.
춘향이 화를 내어,
“여보 도련님 입 보기 싫소. 그만 울고 내력 말이나 하오.”
“사또께옵서 동부승지하여 계시단다.”
춘향이 좋아하여,
“댁의 경사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운단 말이오?”
“너를 버리고 갈 터이니 내 아니 답답하냐.”
“언제는 남원 땅에서 평생 사실 줄로 알았겠소. 나와 어찌 함께 가기를 바라리오. 도련님 먼저 올라가시면 나는 예서 팔 것 팔고 얼마 지난 뒤에 올라갈 것이니 아무 걱정 마시오. 내 말대로 하였으면 딱하지 않고 좋을 것이요. 내가 올라가더라도 도련님 큰댁으로 가서 살 수 없을 것이니 큰댁 가까이 조그마한 집 방이나 두엇 되면 족하오니, 몰래 알아보아 사 두소서. 우리 식구들 가더라도 공짜 밥 먹지 아니할 터이니, 그렁저렁 지내다가 도련님 나만 믿고 장가 아니 갈 수 있소. 부귀를 누리며 임금의 은혜를 입는 재상 집의 품위 있고 정숙한 여인을 가리어서 함께 조석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필지라도 아주 잊든 마옵소서.
도련님 과거 하여 벼슬 높아 외직으로 나아가면 부인과 함께 여장을 차릴 제, 나를 마마로 내세우면 무슨 말이 되오리까. 그리 알아 조처하오.”
“그게 이를 말이냐. 사정이 그렇기로 네 말을 사또께는 못 여쭈고 대부인전 여쭈오니 꾸중이 대단하시며, 양반의 자식이 부모 따라 먼 시골에 왔다 기생집에서 첩을 얻어 데려간단 말이 앞길에도 괴이하고, 조정에 들어 벼슬도 못 한다더구나.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으므로 마땅히 이별이 될밖에 수 없다.”
춘향이 이 말을 듣더니, 지금 막 와락 성이 나서 얼굴빛이 변하며 행동이 침착하지 아니하게 되어 붉으락푸르락 눈을 가늘게 처지게 뜨고, 눈썹이 꼿꼿하여지면서 코가 벌렁벌렁하며 이를 뽀드득뽀드득 갈며, 온몸을 수숫잎 비틀 듯하며 매 꿩 차는 듯하고 앉더니,
“허허 이게 웬 말이오.”
왈칵 뛰어 달려들며 치맛자락도 와드득 좌르륵 찢어 버리며 머리도 와드득 쥐어뜯어 싹싹 비벼 도련님 앞에다 던지면서,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이것도 쓸데없다.”
맑은 거울, 몸 거울을 산호비녀로 두루 쳐, 방문 밖에 탕탕 부딪치며 발도 동동 굴러 손뼉 치고 돌아앉아 <자탄가>로 우는 말이
“서방 없는 춘향이가 세간살이 무엇하며
단장하여 뉘 눈에 사랑받을꼬.
몹쓸 년의 팔자로다.
이팔청춘 젊은 것이 이별 될 줄 어찌 알랴.
부질없는 이내 몸을 거짓된 말씀으로
앞길 신세 버렸구나.
애고 애고, 내 신세야.”
천연히 돌아앉아
“여보 도련님 이제 막 하신 말씀 참말이요, 농담이요?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백년 언약 맺을 적에 대부인 사또께옵서 시키시던 일이오니까. 핑계가 웬일이오. 광한루서 잠깐 보고, 내 집에 찾아와서 밤이 깊어 인적이 끊어진 한밤중에 도련님은 저기 앉고 춘향 나는 여기 앉아, 날더러 하신 말씀, 언덕을 두고 맹세하기보다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낫고. 산에 맹세하는 것은 하늘에 맹세함만 못하다고 작년 오월 단옷날 밤에 내 손길 부여잡고 우둥퉁퉁 밖에 나와 대청에 우뚝 서서 마음에 잊히지 아니하도록 맑은 하늘 천 번이나 가리키며 만 번이나 맹세키로 내 정녕 믿었더니, 끝내 가실 때는 톡 떼어 버리시니 이팔청춘 젊은 것이 낭군 없이 어찌 살꼬. 깊은 밤에 홀로 빈방을 지키는 긴긴 가을밤에 시름과 그리움을 어이할꼬.
모질도다, 모질도다. 도련님이 모질도다. 독하도다, 독하도다. 서울 양반 독하도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한 것이 원수로다. 천하에 다정한 게 부부 사이 정이 유별하건만, 이렇듯 독한 양반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애고 애고, 내 일이야. 여보 도련님 춘향 몸이 천하다고 함부로 버리셔도 그만인 줄 알지 마오. 팔자가 기구한 이 몸 춘향이가, 먹어도 달지 않아 밥 못 먹고 잠들어도 편안하지 않아 잠 못 자면 며칠이나 살 듯하오. 그리움에 병이 들어 애통하다 죽게 되면 슬프고 원통한 내 한 몸이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될 것이니, 높고도 귀하신 도련님이 그것인들 아니 재앙이오? 사람의 대접을 그리 마오. 인물과 관계 맺는 법에 그런 법이 왜 있을꼬.
죽고지고, 죽고지고. 애고 애고, 설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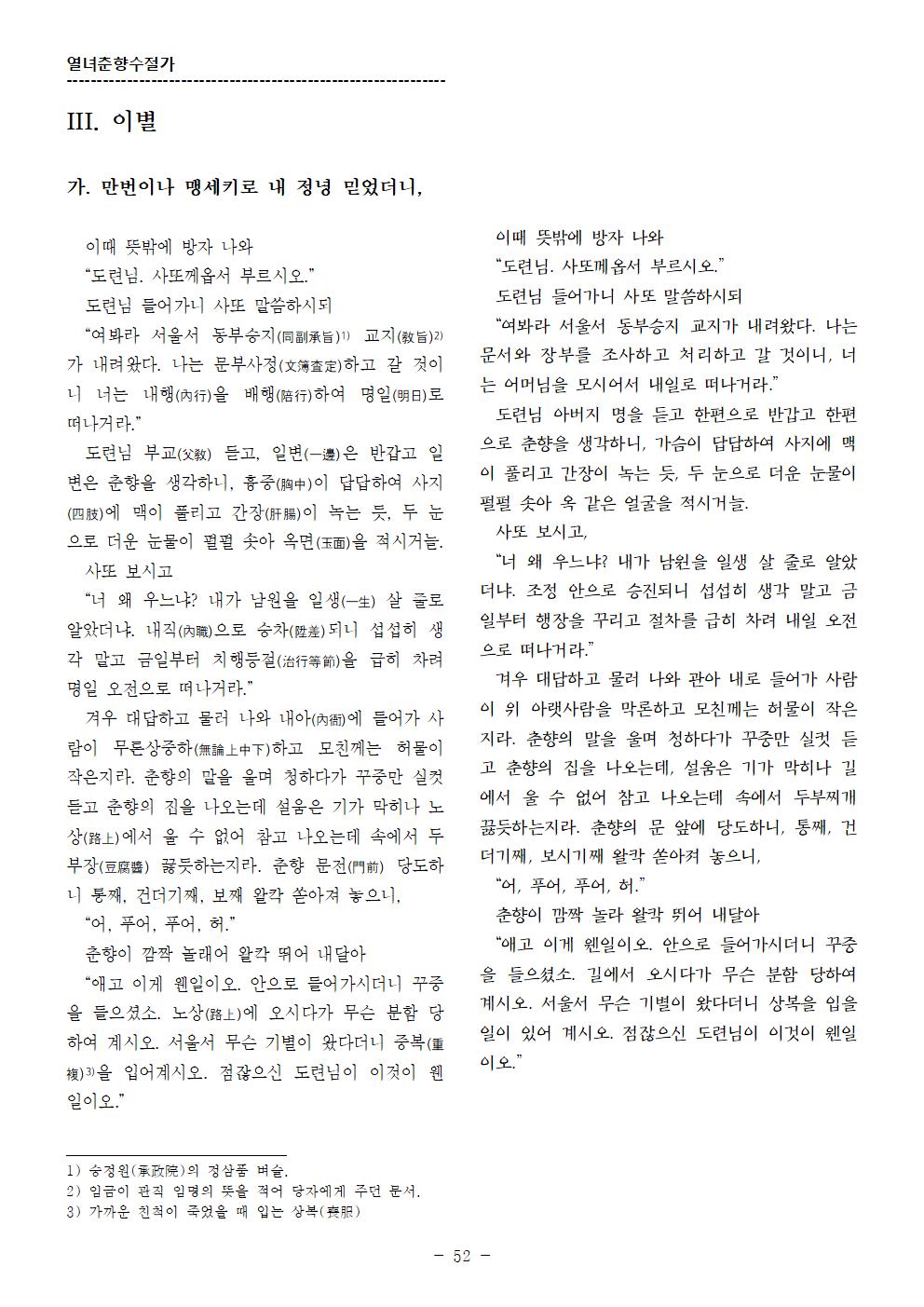



'고전총람(산문) > 열녀춘향수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완판)열녀춘향수절가 - III. 이별 (3/4) (0) | 2020.07.02 |
|---|---|
| (완판)열녀춘향수절가 - III. 이별 (2/4) (0) | 2020.07.02 |
| (완판)열녀춘향수절가 - II. 사랑 (5/5) (0) | 2020.07.01 |
| (완판)열녀춘향수절가 - II. 사랑 (4/5) (0) | 2020.07.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