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남원 부사 어떠하오 공사가 분명하오
이때는 춘삼월 좋은 시절이라.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온화하며 산천 경치 거룩하여 시골 경치 또한 서울보다 더 나음이 많더라.
어사가 마음이 어지럽고 몸이 몹시 지쳐 고단한지라. 다리도 쉬며 경치도 구경하려 꽃 버들 사이에 앉아 사면을 살펴보니, 먼 산은 겹쳐있고 가까운 산은 첩첩, 태산은 넓고 멀어 아득하고, 기암은 층층, 큰 솔은 휘늘어지고, 계곡물은 잔잔, 비오리 둥둥, 두견새 접동새는 좌우에 넘노는데, 계면쩍고 부끄러운 산따오기는 이 산으로 가며 따옥 저 산으로 가며 따옥 울음 울고, 또 한 편 바라보니 모양 없는 쑥꾹새는 저 산으로 가며 쑥국, 이 산으로 가며 쑥국 울음 울고,
또 한 편 바라보니 마니산 갈까마귀 돌도 차돌도 아무것도 못 얻어먹고 태백산 기슭으로 갈가오 갈가오 울며 가고, 또 한 곳 바라보니 층암절벽 간에 홀로 우뚝 섰는 고양나무 겉으로는 비루먹고 좀 먹어 속은 아무것도 없이 아주 텅 비었는데, 부리 뾰족 허리 질룩 꽁지 뭉뚝한 딱따구리 거동 보소. 크나큰 아름드리를 한 아름 들입다 흠썩 안고 뚝두덕 꾸벅거리며 뚝두덕 꾸벅 굴리는 소리 그인들 아니 경치일쏘냐?
또 한 곳 바라보니, 여러 초목 무성한데, 하늘의 복숭아나무, 땅의 복숭아나무, 잣나무, 살구나무, 늘어진 장송, 부러진 고목, 넙적 떡갈나무, 산유자, 검팽, 느릅, 박달, 능수버들, 한 가지 늘어져 한 가지 펑퍼져 휘넘늘어져 굽이 층층 맺혔는데, 십 리 안에 오리나무, 오 리 밖에 십리나무, 마주 섰다 은행나무, 임 그려 상사나무, 입 맞추어 쪽나무, 방귀 뀌어 뽕나무, 한 다리 전나무, 두 다리 들메나무, 하인 불러 상나무, 양반 불러 귀목나무, 부처님 전 공양나무, 이런 경치 다 본 후에 또 한 모롱 지나가니, 높은 곳의 밭, 낮은 곳의 밭들 농부들이 갈거니 심거니, 탁주병에 점심거리 곁에 놓고 <격양가> 노래하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들 제
아득하게 넓은 들판 농부네야.
우리 아니 거리에서 미복으로
동요 듣던 요임금에 버금가지 않나.
얼널널 상사대
잔뜩 먹고 배 두드리는 우리 농부
천만년 즐거워라.
얼널널 상사대
순임금 만드신 쟁기
역산의 밭을 갈고
신농씨 만든 따비
천만 년을 전해오니
그인들 농부가 아니신가.
얼널널 상사대
어서 갈고 들어가서
산중 같은 혀를 물고 잠을 든다.
얼널널 상사대
거적자리 치켜 덮고
연적 같은 젖을 쥐고
얼널널 상사대
밤이 든 후에 한 번 올라
돌송이를 빚은 후에
자식 하나 만들리라.
얼널널 상사대.”
이리 한창 노닐 적에. 어사가 돌통대에 담배 한 대 담아 들고 농부에게 하는 말이,
“담뱃불 좀 붙이자니까?”
모든 농부들이 어사를 보고 모두 모여 둘러앉아 웃음거리 만들 적에,
“이분네 어디에 삽나?”
“요런 맵시 구경합소.”
“실 팔러 다니시오?”
“망건 앞은 들떴습나?”
“꼬락서니 어지럽소.”
“동떨어진 말 뉘게다가 하노?”
“약방 모롱이를 헐고 병풍 뒤에서 잠자다가 왔습나?”
“이 사람들, 그만두소. 보아하니 그래도 철끝일세. 당초에는 외입하고 극성맞게 놀던 왈짜로세. 의복 꼴은 그러하나 옷걸이는 제법일세. 자시는 담뱃대 고소를 몇 번이나 당했소?”
“이 사람들, 가만두소. 저런 사람 무서우니 아닌 밤에 다니다가 불 지르기, 남의 집의 들어가서 무슨 물건 도적하기 일쑤니라.”
“이 애. 이것 귀경하라. 박쪼가리 관자로다.”
옆구리를 꼭 찌르며,
“이 애 보소. 마다하오.”
그중 한 늙은 농부가 내달아 말리는 말이,
“이 사람들아. 그리 마라. 바람결에 얼른 들으니 어사 떴단 말이 있으니 이 사람 괄시 마소. 그도 전혀 싱거운 사람은 아니기로 세 폭 자락에 동떨어진 말하니, 과히 괄시 마소.”
어사가 내심에 헤아리되,
“사람은 늙어야 쓴다는 말이 옳다.”
하고, 무슨 말을 하려 할 제 또 한 놈 내달으며 하는 말이,
“에라 에라, 그만두라. 모양 거룩하옵시다. 주제 추레하면 양반이 아닌가? 왜들 그리 구노. 양반 대접 아니로세. 영조 임금 때 계셨다면 인물 당상관은 어디에 가며, 남원 땅에 들어가면 춘향의 서방 되리로다.”
모든 농부가 골을 내어 뺨을 치며 하는 말이,
“백옥 같은 춘향이를 제아무리 없다 하고, 뉘게다가 비기나니. 미친놈이로다.”
저희끼리 다투거늘, 그곳을 후리치고 한 곳을 다다르니, 계곡의 바위와 우거진 나무숲이 그윽하고 은근하고 그윽한 흥이 새로워라.
바람결에 종소리와 풍경소리 들리거늘, 찾아가니 산속의 불당이라. 판도방 들어가니 승려와 속인의 구별 없이 거동 보소. 걸인으로 대접하여 밤을 겨우 지낼 적에, 공부하러 온 소년 선비들이 어사 보고 손뼉 치며 크게 웃으며 온 가지로 보채거늘 어사가 정색하고 이른 말이,
“상스럽게들 굴지 마오. 선비 도리 몹시도 이상하오.”
여러 선비 의논하되,
“제가 만일 양반이면 밥 얻어먹을 만할 문자나 알 것이니, 운자 불러 글 짓거든 우리 저를 공경하여 대접하고, 글을 만일 못 짓거든 엉덩이를 때려 쫓아냄이 마땅하다.”
하고, 운자를 강운으로 창창강당강 다섯 자를 내어주니, 묻는 대로 거침없이 대답하여 지었으되,
“우연히 객이 되어 어여쁜 창에 오니.
약초밭에 봄이 와 구절 창포 키우네.
처마 밖의 옥봉오리 북극에 닿았는가.
임금 앞의 금부처는 서강에서 왔도다.
몸은 학 같은데 어찌 오리를 받아들일까.
마음은 매미라서 사마귀 같지 못하네.
산사의 종소리 그치자 밥 올리니,
밥상 신선한 채소가 산초와 생강을 재촉하네.”
모든 선비 글을 보고 크게 놀라, 여러 번 절을 하며 사례하고, 우러러 사모하고 공경하며 축복하며 밤새도록 문답할 새, 각읍 소문 탐지하려 선비에게 묻는 말이,
“남원읍내 사람에게 빌린 돈을 받기 위해 송사하려 하니 관청의 일이 분명할지요?”
한 선비 내달으며 말라고 하는 말이,
“남원 부사 말을 마오. 제물을 탐하고 여자를 밝히며 무도하여, 백성이 소를 잃고 관아에 고하니, 양쪽을 불러들여 원고에게 분부하되,
‘너는 소가 몇 필인가?’
대답하되,
‘황소 한 필, 암소 한 필, 다만 두 필 있었더니, 황소 한 짝 잃었습니다.’
또 묻되,
‘저 도적놈 너는 소가 몇 필이니?’
대답하되,
‘소인은 워낙 가난하여 한 필도 없나이다.’
‘소 임자놈 들어보라. 너는 무슨 복을 누리려는 힘으로 두 필 탐이 두고, 저놈은 무슨 죄로 한 필도 없단 말이니? 한 필씩 나눴으면 사방으로 탈이 없고 송사를 거는 까닭이 공평하리라.’
하고, 소 임자의 소를 빼앗아 도적놈을 주었으니, 이런 공사 또 있으며, 백옥 같은 춘향이를 억지 겁탈하려다가 도리어 욕을 보고 엄한 형벌로 무겁게 다스리고 옥에 가두어 병든 지 한 해 만에 지난달 첫머리에 고생하다가 죽어, 이 산 너머 저 산 너머 초빈 하였으니, 그인들 아니 못됨이 쌓여 있지 않은가?”
어사가 이 말 듣고, 춘향이 죽은 줄을 자세히 알고 정신이 아득하고 설운 마음이 복받쳐 입시울이 비죽비죽 눈물이 등겅등겅 하거늘, 모든 선비 괴이 여겨 의논하되,
“그 걸인의 형상 보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금하지 못하니 그 아니 괴이하냐. 저를 속여보자.”
하고, 중 불러 분부하되
“팻말 하나를 깎아다가 아무 데나 새로 초빈 한 데 꽂아 놓고 멀리 서서 거동 보라.”
그 팻말에 글을 쓰되, 맹랑히도 하였구나.
‘본읍 기생 수절원사 춘향지묘’라 하여 중놈 주어 보내니라.
어사가 천만 꿈 밖에 춘향 흉한 소리 듣고, 남 웃길 줄 전혀 잊고 춘향 초빈 찾아가니, 털과 뼈가 오싹하고, 정신이 황망하다. 급급히 걸어 한 고개를 넘어가니 새로 한 무덤이 있고, 팻말을 꽂았거늘 자신도 모르는 결에 달려들어 무덤을 두드리며 대성통곡하는 말이,
“애고 춘향아. 이것이 웬일이니? 우리 둘이 백년기약 맺었더니, 이제는 허사이로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길을 가며 천 리에 내 오기는 너만 보려 하였더니, 죽는단 말이 웬일이니? 빈 산에 달빛만 적막한 데 누웠느냐, 잠자느냐?
내가 여기 왔건마는 모르는 듯 누었구나. 기러기는 높이 나는데 무덤만 푸르르고, 변방의 달은 여대에 지는구나. 산풀과 들꽃은 해마다 피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한번 가고 돌아오지 않는구나. 애고 애고 설운지고.”
두 주먹귀 쥐어다가 무덤을 쾅쾅 두드리며,
“춘향아, 춘향아. 날 보고 일어나라. 얼굴이나 잠깐 보자. 목소리이나 들어보세. 너를 어디에 가 다시 보리. 애고, 이를 어찌할꼬? 차마 설워 못 살겠다.”
구슬프게 슬피 우니 근심스러운 구름이 참담하고, 해와 달이 빛이 없고 초목이 슬퍼하고 금수도 울음 운다.
한창 이리 슬피 울 제, 건넌 마을 강 좌수가 이 형상을 바라보고 마음에 놀랍고 괴이하여 급히 들어가 마누라에게 하는 말이,
“우리 아기 살았을 제 아직 혼인하지 않는 처녀이거든, 어떤 거지놈이 백년기약이 허사라고 두드리며 울음 우니 요런 변이 또 있는가? 이놈, 고두쇠야. 몽치 차고 건너가서 아기씨 무덤의 우는 놈 마구 때려서 죽게 하라.”
고두쇠 건너가서 꾸짖으며 욕하고 달려드니 어사가 매우 급하여 혼이 떠서 삼십육계 중 줄행랑이 으뜸이라. 천방지축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가니 이 또한 장관일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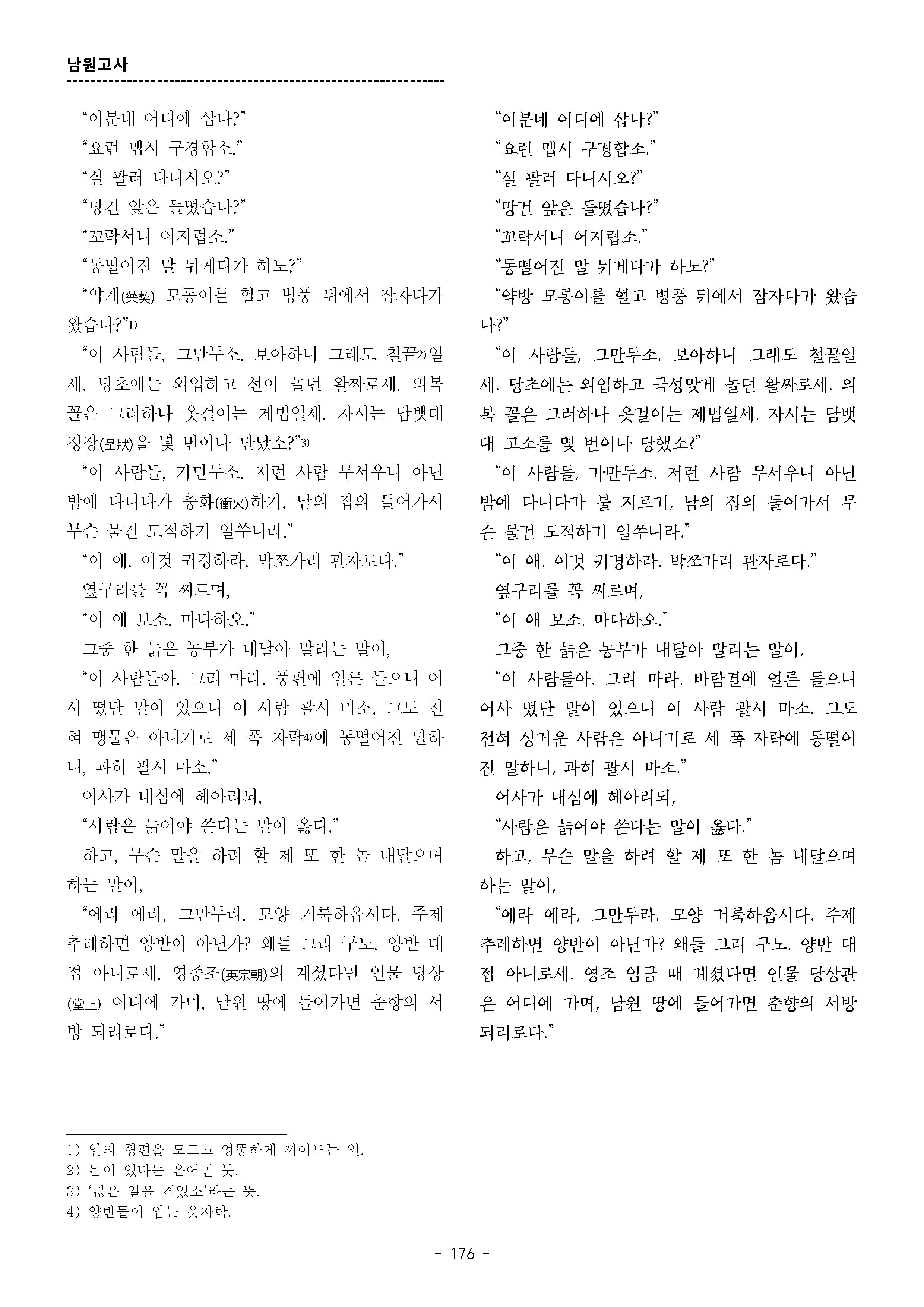




'고전총람(산문) > 남원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판)남원고사 - XI. 어사 이몽룡 (4/4) (0) | 2020.06.28 |
|---|---|
| (경판)남원고사 - XI. 어사 이몽룡 (3/4) (0) | 2020.06.28 |
| (경판)남원고사 - XI. 어사 이몽룡 (1/4) (0) | 2020.06.28 |
| (경판)남원고사 - X. 옥중 춘향 (2/2) (0) | 2020.0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