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한 산 넘어 오 리되고 한 물 건너 십 리로다
방자 불러,
“책방에 돌아가서 대나무 화분 하나 가져다가 나의 춘향 주어다고. 오동나무에 밤비 내려 잠 깬 후와 나비가 봄바람에 날아가는 긴긴밤에 날 생각 나거들랑 날 본 듯이 두고 보라.”
춘향이 이른 말이,
“온갖 풀을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는다 하오. 화살대는 가고, 피리대는 울고, 그리나니 붓대로다. 울고 가고 그리는 대를 구태여 어이 심으라 하오.”
“네가 어이 알까 보니?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는 영원히 변치 않는 절개라. 겨울 하늘에도 푸르렀고 눈 속에도 순 나니, 계집의 절개를 지키는 행실이 이 대의 본을 받아 정성으로 심어두라.”
남대단 두루주머니, 주황당사 끈을 끌러 화류집 사파경을 집어내어 춘향 주며 이른 말이,
“대장부의 굳은 마음 석경 빛과 같을지라. 티끌 속에 묻혀 있어 천백 년이 지나간들 석경 빛이 쇠할쏘냐? 이것으로 믿음을 삼아 두라.”
춘향이 받아 손에 쥐고,
“이것이 평생 신물이라. 또한 대신 드릴 물건이 없으리까.”
하고, 보라 대단 속저고리 맹자고름 어루만져 옥반지를 끌어내어 이도령 주며 하는 말이,
“여자가 몸을 닦음은 옥반지 빛과 같을지라. 소나무 대나무같이 굳은 마음 이 옥같이 단정하며, 해와 달같이 맑은 뜻은 이 옥같이 희고 맑으니, 뽕밭이 바다 되고, 바다가 뽕밭 된들 변할 바가 없으리니, 반첩여의 적막함은 본받을지언정, 진유자의 첩 되기는 원치 아니하오리니, 이것으로 믿음을 삼으소서.”
이도령이 반지 받아 싸고 싸서 깊이 넣고, 이별노래 하나 부를 적에,
“간다. 잘 있거라. 좋이 다시 보자. 좋이 있거라. 간들 아주 가며 아주 간들 잊을쏘냐? 잠 깨어 곁에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매라.”
춘향이 화답하되,
“울며 잡는 소매를 떨어뜨리고 가지 마오. 도련님은 장부라 돌아가면 잊으려니와, 소첩은 아녀자인 고로 못 잊을까 하노매라. 산은 첩첩하고 물이 겹겹으로 있으니, 부디 평안히 가오. 가다가 긴 한숨 나거든 낸줄 아오.”
이렇듯이 이별할 제 차마 어찌 떠나오리. 마주 잡고 서로 울 제 책방 방자가 달려들어 성화같이 재촉하되,
“사또 분부 내려 도련님 계신 곳을 알아 성화같이 뫼셔오라, 서서 기다리시니 편전같이 가옵시다.”
둘이 다 깜짝 놀라 하는 말이,
“너는 병환에 까마귀요, 혼인에 트레바리로구나. 너는 사람 냄새 잘 맡는 빈대 자식 붙어 낳았느냐? 끔찍끔찍이 재촉 마라. 소하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 몸이냐? 만날 때도 네 덕이요, 이별할 때도 이리하니 애고 답답 나 죽겠다.”
하릴없이 돌아올 제 춘향은 진이 다 빠져 늘어지고 이도령은 갓 죽은 송장으로 돌아오니, 사또 불러 이른 말이,
“나는 끝내지 못한 일이나 다 닦고, 중기 마감 후에 수일간 떠날 것이니, 너는 즉시 길을 차려 내일 신주 뫼시고 일찍 떠나게 하라.”
이도령이 그 말은 여산 풍경에 헌 쪽박이라. 춘향 생각만 골수에 박혀 열 길이나 설운 울음 줄 때까지 참았다가 입을 열 제, 한마디 소리 툭 터지며,악바회골 모진 범이 절굿공이로 쌍주리를 틀리고 인왕산 기슭으로 가는 소리처럼 동헌을 허는 듯이 북받쳐 우니, 사또 달래어 하는 말이,
“용렬하다. 울지 마라. 남원부사를 나만 하랴. 수삼 일간 올라갈 것이니 그다지 울도록 하랴. 그리 말고 마음을 바르게 살피라.”
이도령이 그러한 체하고, 동헌부터 책방까지 울며 나와 식음을 전폐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워 해 뜰 무렵에 길 떠날 제 사당, 내행 다 뫼시고 뒤따라 올라간다.
“가노라, 남원 땅아. 다시 보자, 잘 있거라. 광한루야, 눈물이 앞을 가리는 남원과, 슬픔을 머금은 서울 길에, 새 정이 미흡하여 고운 임을 이별하니, 눈을 떠도 춘향이요, 감아도 춘향이라.
길에 가는 행인들이 다 춘향인 듯, 꽃 같은 고운 얼굴 눈앞에 가물가물하고 낭랑한 말소리는 귓가에 쟁쟁하니, 내 마음 쇠돌이 아니거든 이리하고 어이 하리.”
가재걸음이 절로 난다. 먼 산만 바라보고 근심하며 슬프게 올라갈 제, 한 모롱이를 지나가다 십리정에 다다라서 문득 들으니, 절절 원한 품은 슬픈 울음소리 반공중에 사무치니 모골이 송연하고 마음이 찢어짐이라.
정신이 어질하고 뼈끝이 저려 오니, 마부에게 묻는 말이,
“처량한 저 울음을 뉘가 이리 슬피 울어 나의 심사를 산란케 하느뇨?”
마부놈 채를 들어 한 곳을 가리키되,
“저 건너 솔숲 사이에 어떠한 여인이 우나이다.”
이도령 생각하되,
“우리 춘향이가 나를 보려 가는 길에 와서 기다리나 보다. 마부야 말 잡아라. 뒤를 잠깐 보고 가자.”
울음소리를 찾아갈 제 점점 깊이 들어가니 마부놈 여쭈오되,
“여기서 뒤 보시지 어디에로 들어가오?”
이도령 돌아보며 꾸짖으되,
“백발이 놈, 네로구나. 아무 데서 보던지 네 아랑곳이냐?”
하며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
“네로구나.”
춘향이 마주 잡고 그저 데굴데굴 함부로 탕탕 부딪치며
“너고 나고 예서 죽자.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나니?”
“도련님 가시는 길에 잔치하여 작별하려 왔사오니, 마지막 이별의 잔을 잡으시오.”
술을 부어 권할 적에 장부의 심장이 다 상한다. 고운 손을 자주 들어 눈물을 쥐어 뿌리면서,
“천지 인간 이별 중에 나 같은 이 또 있는가? 애고 도련님, 내 말 듣소. 차마 설워 못 살겠네. 오동잎 지는 달 밝은 밤과, 수양버들에 맑은 바람 부는 봄날에 그리워 어찌 살라 하오.”
이도령 위로하되,
“네 속이나 내 속이나 간장이야 다를쏘냐? 석벽에 양 견디듯 수삼 년만 기다려라.”
서로 잡고 울음 울 제 마부놈 달려들어,
“도련님 어서 일어나오. 대부인 마누라님이 앞 참에서 도련님을 찾으신다 하고, 관노놈이 왔사오니 어서 바삐 일어나오.”
이도령 이른 말이,
“너도 목석이 아니라, 이 형상을 네가 보니 차마 어찌 떠나리오. 돈을 많이 후히 주마. 한 말만 잠깐 더하고 가자.”
마부놈 여쭈오되,
“천 리를 가나 십 리를 가나, 한때 이별은 없어서는 안되는 일이오니 제발 덕분 일어나오.”
하릴없이 떠나오니 둘이 간장이 다 사라진다. 저 춘향의 거동 보소. 녹는 듯이 울음 울며,
“도련님 부디 평안히 가오. 떠나는 회포는 측량 없거니와, 나 같은 천첩은 조금도 생각 말으시고 서울 올라가서 학업이나 힘써 선조의 덕으로 뜻을 이루신 후에 부디부디 날 찾아오시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다릴 제 바라는 눈이 뚫어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도령 이른 말이,
“오냐. 부디 잘 있거라.”
애틋하게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여 차마 손을 놓지 못하고 소매를 들어 눈물을 씻으면서 당부하는 말이,
“나의 일은 염려 말고 몸을 삼가고 신의를 지키어 나의 돌아오기를 고대하라.”
하고 떠날 줄을 잊었더니 서산에 해는 늦어가고 재촉이 성화 같은지라. 마지 못하여 손을 놓고 말에게 올라 돌아서니, 한걸음에 돌아보고 두 걸음에 기가 막혀 갈 길이 아득하다. 목이 맺혀, 연속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잘 있거라.”
“부디 평안히 가오.”
이렇듯이 목쉰 소리로 이별할 제 길이 점점 멀어 간다. 한 산 넘어 오 리 되고, 한 물 건너 십 리로다. 다만 둘이 입만 벙긋벙긋하되 음성은 아니 들리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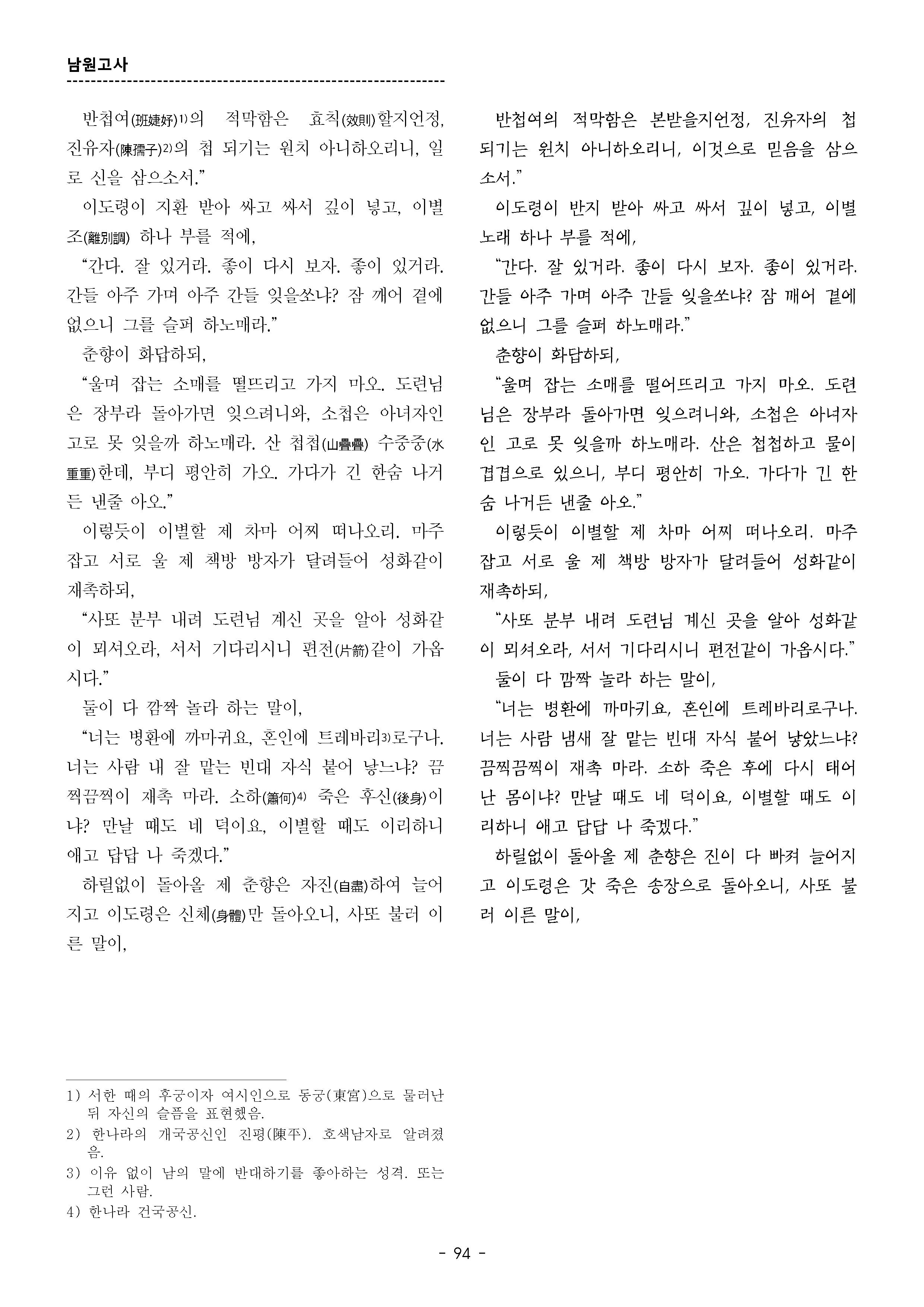



'고전총람(산문) > 남원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판)남원고사 - VII. 신관 부임 (1/4) (0) | 2020.06.25 |
|---|---|
| (경판)남원고사 - VI. 이별 설움 (4/4) (0) | 2020.06.24 |
| (경판)남원고사 - VI. 이별 설움 (2/4) (0) | 2020.06.24 |
| (경판)남원고사 - VI. 이별 설움 (1/4) (0) | 2020.06.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