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이별 설움
가. 이 말이 웬 말이요 이별말이 웬 말이오
남원부사 백성을 바르고 어질게 잘 다스려 묘당이 의논하여 공조참의 윗자리의 벼슬로 올리니, 임금께서 내린 말을 타고 올라갈 제,
이도령의 거동 보소. 뜻밖에 당한 일이 마른하늘 급한 비에 된 벼락이 나리는 듯, 모진 광풍에 돌과 화살이 날리는 듯, 정신이 어질하고 마음이 끓는 듯하여 죽을밖에 하릴없다.
두 주먹을 불끈 쥐어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이를 어이 하잔 말인고?. 옥 같은 나의 춘향 생이별을 한다는 말인가. 사람 못 살 운수이라. 내직으로 올라감은 무슨 일인가. 공조참의 하지 말고, 이 고을 좌수로나 주저앉았다면 내게는 퇴판 좋을 것을. 애고 이를 어찌할꼬. 가슴 답답, 나 죽겠다.”
허둥지둥 춘향의 집 찾아가니, 저는 아직 몰랐구나. 반겨 와락 내달리며 들입다 허리를 덥석 안고 칠보잠의 금나비같이 한 몸을 바드드 떠는구나.
이도령의 거동 보소. 수심이 첩첩하여 슬픔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말을 하려 하니 기가 막혀 죽겠다. 네가 나지를 말았거나, 내가 너를 몰랐거나 여러 말 할 것 없이 죽을밖에 하릴없다.”
춘향이 옴찍 놀라 묻는 말이,
“이것이 무슨 말씀이오. 어제 날 나오실 제 희색이 만면하여 나를 보고 반기실 제, 해당화의 범나비같이 너울너울 노시더니, 오늘은 별안간에 수색이 얼굴에 가득하고 말씀조차 이리 맹랑하오?
집안 어른께 꾸중을 물어왔소? 몸이 어디가 불편하오? 어찌한 곡절인지 자세히 아옵시다.”
이도령 울며 대답하되,
“떨어졌단다. 떨어져.”
춘향이 놀라 대답하되,
“어디에 가 낙상을 하였단 말이오? 그래서 대단히나 다치지 아니하였소?”
“뉘 아들놈이 내가 떨어졌다더냐? 어르신네가 곯았단다. 곯아.”
“애고, 곯다니, 사또 갈리셨나 보오.”
“그렇단다.”
“그래요? 애고, 그러면 왜 울기는? 더 좋지요. 내직으로 좋은 벼슬 승차하시거나, 외직으로 하옵셔도 광주 나주 목사 같은 것, 영변, 영유 같은 데로 가시면 작히 좋을까? 나는 내 세간 다 가지고 삿갓가마 타고 도련님 뒤를 따라가지요.”
이도령이 두 소매로 낯을 싸고, 목이 메어 하는 말이,
“잘 따라오너라. 잘 따라와. 그러할 터 같으면 뉘 아들놈이 어렵게 여기어 꺼리랴?”
춘향의 거동 보소. 얼굴빛이 달라져서 하는 말이,
“애고 이 말이 웬 말이오, 이별 말이 웬 말이오?”
섬섬옥수 불끈 쥐어 분통 같은 제 가슴을 법고 치는 중이 법고 치듯 아주 쾅쾅 두드리며, 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삼단 같은 제 머리를 홍제원 나무장사 잔디 뿌리 뜯듯 바드덩 바드덩 쥐어뜯으며,
“애고 애고, 설운지고. 죽을밖에 할 일 없네. 날 속이려고 이리하나. 조르려고 실없는 말로 놀리나? 깁수건을 끌러 내어 한끝일랑 나무에 매고, 또 한 끝일랑 목에 매고, 뚝 떨어져 죽고지고. 맑고 맑은 연못에 풍덩 빠져 세상을 잊고지고. 아무래도 못 살겠네.
잡말 말고 나도 가옵시다. 꺼꺽 푸드덕 장끼 갈 제 아로롱 까투리 따라가듯, 녹수 갈 제 원앙 가고 청수리 갈 제 씨암탉 가고, 청개구리 갈 제 실뱀이 가고, 구름이 용을 따르고, 바람이 범을 따르고, 구름 갈 제 비 가고, 바늘 갈 제 실이 가고, 봉이 갈 제 황이 가고, 이별 낭군 도련님 갈 제 청춘 소첩나도 가세.
쌍교는 지나치니 말고, 독교는 슬프니 말고, 가마를 꾸미되 가마꼭지는 선명하고 새빨갛게 칠을 하고, 가마뚜껑은 궁초로 싸고, 가마 청장대는 먹감나무로 하고, 가마 발은 순담양 들어가서 왕대를 베어다가 쇠구멍 뽑아내어 당주홍 칠하여 색 고운 청면사로 거북 무늬처럼 얽어내어 당 말액실로 금전지 달고, 휘장은 백설이 풀풀 흩날릴 제 담비 가죽으로 두르고, 가마 얽기는 생명주로 치고,
가마채 드는 놈이라도 뒤꼭지는 세 뼘이요, 풍채가 좋고 덩치 당당한 건장한 놈으로 좋은 전립, 천은 영자 넓은 끈을 달아 쓰고, 외올 망건 당사끈에 적대모 고리 관자 양쪽 귀밑에 떡 붙이고, 자지수 한단 절구통 저고리, 통명주 당바지, 삼승으로 물겹옷 지어 앞자락을 제쳐다가 뒤로 매고,
삼승 버선에 종이총 미투리 낙복지로 두 겹으로 걸어 들어 메이고, 팔뚝에 힘을 올려 골 거두어 뒤채를 꼬늘 적에, 위르렁충청 걷는 말에게 절반 정도 부담하여 떵떵 그렇게 날 데려 가오.
그럴 터가 못 되거든 다 훌쩍 떨쳐 버리고 여복을 하지 말고 남복을 하되, 보라 동옷 당바지의 대님 매고, 행전치고 갈매나무 물을 짙게 들여 긴 옷을 지어 입고, 머리 따아 궁초댕기 석웅황에 뒤로 출렁 늘어치고, 당채련 띠를 띠고, 겹옷자락을 접어다가 어슥비슥 꽂은 후에, 두 푼짜리 세코짚신 단단히 들어 멘 후에, 오른손으로 채를 들고 왼손으로 곁마 들어 도련님 올라가실 적에 나귀 견마나 들고 가세.”
이도령 이른 말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제발 덕분 울지 마라. 네 울음소리 장부의 한 토막의 간과 창자가 다 녹는다. 이리 애를 쓰고 어찌하리.
널랑 죽어 물이 되되 하늘 위의 은하수, 지하의 폭포수, 동해수 서해수 일대의 긴 강물 다 후리쳐 던져두고, 끓는 물에 찬 물을 섞은 물이 되고, 날랑 죽어 새가 되어도 난새와 봉황, 공작, 두견, 접동 다 후리쳐 던져두고, 원앙조란 새가 되어 그 새가 그 물을 보고 반겨라고 풍덩실 빠져 있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잇따라 헤지 말고 어화둥실 떠 있고저.
그렇지 못하거든 널랑 죽어 방아확이 되고 날랑 죽어 방앗공이 되어,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강태공의 만든 것처럼, 네 계절 큰 하늘을 헤아리지 말고 떨구덩 찧었고저.
그렇지 못하거든 널랑 죽어 암톨쩌귀 되고, 날랑 죽어 수톨쩌귀 되어, 하얗게 꾸민 벽에 비단을 바른 창을 열 제마다 제 구멍에 제 쇠가 박혀 춘하추동 사시 없이 빠드덕 빠드덕 하였고저.
그렇지 못하거든 널랑 죽어 강릉 삼척 들어가서 오리목 되어 서고, 날랑 죽어 삼사월 칡넝쿨 되어 한없이 뻗어갈 제,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들 건너 벌 건너 힘들이지 않고 선뜻 건너뛰거나 올라서서 건너가서, 그 나무 밑부터 끝까지 가늘고 긴 나뭇가지마다 납거미 나비 감듯 왼쪽으로 풀어 오른쪽으로 감고, 오른쪽으로 풀어 왼쪽으로 감아 나무 끝끝마다 휘휘친친 감겨 있어 봄날이 다 지나도록 떠나 살지 말자 하더니, 인간에 일이 많고 조물주조차 샘을 내어 새로 사귄 정이 미흡한데 애달플손 이별이야.
만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 하자 했더니 금일 이별 어이 하리. 너를 두고 가자는 말인가. 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차 말고, 이 고을 풍헌만 하시더면, 이런 이별 아닐 것을 생눈 나올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 하잔 말인고? 귀신이 훼방을 놓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뉘를 한탄하자 하니 속절 춘향 전혀 없다. 네 말이 다 못될 말이니 아무렇게나 잘 있거라.”
춘향이 대답하되,
“우리 당초 광한루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에게 살자 하였소?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당초 마다 아니하였소? 우리 올해 쇠붙이와 돌처럼 굳고 변함없는 약속이 오늘날에 다 허사로세.
이리구러 분명 못 데려가겠소? 진정 못 데려가겠소? 내 마음을 떠보려 이리하오? 종래 아니 데려가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서 날 호리려고 글에다 명백히 써서 준 것 있으니, 소지 지어 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사연으로 사정을 하소연하여 널리 알리겠소.
원님이 만일 당신 귀공자의 역성 들어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소지 덧붙여서 사정을 하소연하여 전주 감영 올라가서 순사도께 의송하면 도련님은 양반인 고로 편지 한 장만 부치면 순사또라도 똑같이 양반편을 들어 또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거든, 그 제사 또 덧붙여서 한양성 안에 들어가서 형한, 양사, 비국까지 정하오면, 도련님은 사대부로 이리저리 갖은 방법을 다 써 가며 여러 곳에 청하여 또 송사를 지우거든, 그 제사 모두 덧붙여서 똘똘 말아 품에 품고, 팔만 장안 억만 집들마다 마을마다 빌어먹고 다니다가,
돈 한 푼씩 빌어 얻어 질그릇 가게에 들어가서 바리뚜껑 하나 사고, 종이 가게 들어가서 장지 한 장 사 가지고 언문으로 상소 한 장 쓰되,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글로 만들어 가지고,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로나 서교로나 능행 거동하실 때에 문밖으로 내달아서 떼를 지은 뭇사람 가운데 섞였다가 용대기 지나치고, 협련 자개창 들어서고, 붉은 양산 떠나오며 가교에나 말 위에나 풍채 좋게 지나실 제, 왈칵 뛰어 내달아서 바리뚜껑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땡땡하고 세 번만 처서 격쟁까지 하오리다.
애고 애고, 설운지고. 그리하여 또 못 되거든 애써 말라 초조하여 죽은 후에, 넋이라도 삼수갑산 제비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맛기슭에 집을 종종 지어두고 밤중만 집으로 드는 체하고, 도련님 품으로 들어볼까.
이별 말이 웬 말이오. 이별 이자 내던 사람 나와 백 년 원수로다. 진시황 책 불태울 제 이별 두 자 잊었던가. 그때에나 살랐다면 이 이별이 있을쏘냐? 박랑사중 쓰고 남은 철퇴 천하장사 항우 주어 힘껏 둘러 메여 깨치고저. 이별 두 자 영소보전에 솟아올라 옥황상제께 널리 아뢰어 벼락 상좌 내려와서 때리고저.
이별 두 자 오랑캐 땅에 모자 이별, 남북의 군신 이별, 고향 가는 길의 부부 이별, 운산에서의 벗과의 이별, 헤어질 때 낙엽이 날리니 형제 이별, 살아 생이별, 죽어 영이별, 이 이별 저 이별, 이별마다 섧건마는 이 이별은 생초목에 불이 붙네.
사랑도 처음이요, 이별도 처음이라. 옥 같은 창자가 끊어지고 비단 같은 마음이 녹아온다. 애고 답답, 설운지고, 이를 어찌하자는 말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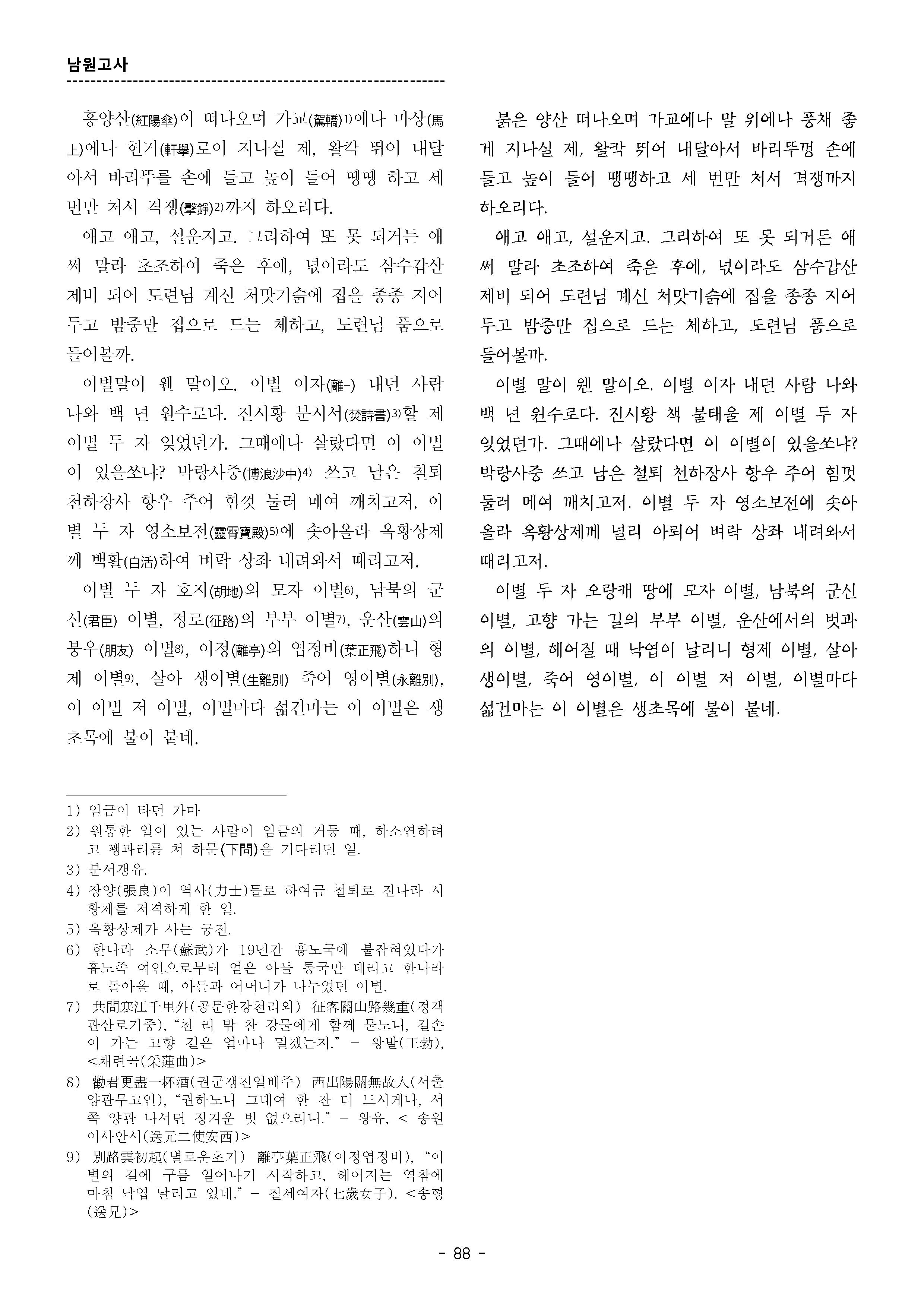

'고전총람(산문) > 남원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판)남원고사 - VI. 이별 설움 (3/4) (0) | 2020.06.24 |
|---|---|
| (경판)남원고사 - VI. 이별 설움 (2/4) (0) | 2020.06.24 |
| (경판)남원고사 - V. 사랑 타령 (4/4) (0) | 2020.06.24 |
| (경판)남원고사 - V. 사랑 타령 (3/4) (0) | 2020.06.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