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쌀앵동 거문고에 소리 섞어 노래하니
가사를 마치매 이도령 이른 말이,
“푸르고 푸른 연못에서 술 보고 못 먹으면 머리털이 희게 센다 하니 저 병 술도 먹어 보자.”
연하여 부을 적에 이도령의 주량이 넓은지라. 무한 먹어 준다.
“쫄쫄 부어라. 풍풍 부어라. 쉬지 말고 부어라. 놀지 말고 부어라. 바스락바스락 부어라. 온 병에 채운 술이 유영이가 먹고 간 뒤에 남긴 반 병임이 분명하다. 마저 부어라. 먹자꾸나.”
양의 넘도록 흠썩 먹어 놓으니 술에 잔뜩 마셔 세상일을 몰라보니 호리병 속에 천지가 있는 듯 술에 크게 취한지라. 오장육부 온 뱃속이 크나큰 바다 위에 오리 뜨듯, 사람이 밀지 않았어도 옥산이 절로 무너진 듯하더라.
무한히 주정하는 말이,
“네 인물도 묘하거니와 갖은 재조 뛰어나게 훌륭하니, 너고 나고 하늘이 정한 배필임이 분명하다. 너는 어이 인제 나고, 나는 어이 인제 났노? 정에 겨워 못 견디겠다. 너는 내 딸로 정하리라.”
춘향이 웃고 대답하되,
“사람에게 삼강오륜이 분명하니, 삼강에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됨이요, 오륜에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으니 이것이 무슨 말씀이오?”
“아서라. 물렀거라. 세상에 사람 되고 삼강오륜 모를쏘냐? 서울은 한강이요, 평양 대동강, 공주 금강이 삼강이라 일렀고, 서울 벼슬에 한성부 판윤, 좌윤, 우윤, 경상도 경주 부윤, 평안도 의주 부윤, 이것이 오륜이니, 내 어찌 모를쏘냐? 내 딸 되기 원통하거든 내가 네 아들이 되자꾸나.”
횡설수설 중언부언하여 온 가지로 트집 잡아 따지다가 눈을 들어 거문고 세운 것을 보고 이른 말이,
“저 우뚝 섰는 것이 싸개질꾼이냐?”
대답하되,
“사람이 아니라 거문고요.”
“검은 괘라 하니, 옻칠한 괘냐, 먹칠한 괘냐?”
“검은 것이 아니라 타는 것이오.”
“타는 것이라 하니, 잘 타면 하루 몇 리나 가느냐?”
“그렇게 타는 것이 아니라 뜯는 것이오.”
“종일 잘 뜯으면 몇 조각이나 뜯나니?”
“그렇게 뜯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줄을 희롱하면 풍류 소리 난다 하오.”
“정녕히 그러하면 한번 들을 만하구나.”
춘향의 거동 보소. 칠현금 내리어 무릎 위에 놓고 손을 빼어 줄 고르고, 섬섬옥수로 대현을 타니 늙은 용의 소리요, 소현을 타니 푸른 학의 울음이라. 쌀앵동흥청청 이렇듯이 타며 노래 섞어 부르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인간이 자질구레하거늘 세상사를 쓰려 치고
속세의 그물에서 뛰어나와 정처 없는 이내 몸이
산이야 구름이야 천리만리 들어가니
천 굽이 푸른 시내 첩첩한 구름산이
갈수록 새롭구나.
층층한 절벽에 굽은 늙은 장송
청풍에 흥을 겨워 날 보고 우줄우줄
구룡소 늙은 용이 여의주를 얻노라고
굽이를 반만 내어 푸른 물을 뒤치는 듯
낭떠러지에 부딪히는 물결은
구름에 이어졌고,
푸른 숲 붉은 꽃은 봄바람에 분별 있고
조화에 교태 겨워 간 데마다
구십 일간의 봄빛을 자랑하니
구름 낀 숲속에서 온갖 경치
즐거움이 끝이 없다.
무정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산중에 들어오니 날 찾을 이 뉘 있으리.
어화 즐겁구나. 이것이 어디멘고.
맑은 바람 밝은 달을 값을 주고 사랴마는
나와 정이 있었는지 간 데마다 따르는가.
옛사람 이른 말이
어진 마을에 제대로 골라 살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지혜롭다 하였으니
한가하게 머물 곳을 찾는 것이
이곳이라 할 지로다.
벌써 못 온 줄을 금일이야 깨닫괘라.
지난 일을 상관 말고 앞날을 헤아리자.
손흥공의 산수부를
목 내어 맑게 읊고
이제야 허리 펴자, 이 아니 즐거우냐.
내 몸을 의지하리라
한 칸 초가집을 암혈에 얽어매어
구름 덮여 던져두고
청산은 네 벽이요,
흰 구름은 풀로 엮은 지붕이라.
돌솥에 밥을 짓고
낭떠러지에 올라 나물을 뜯으니
이리 와 한가하기도 역시 하늘의 명이로다.
산중에 들어앉아 세월이 하 오래니
지금의 천자와 임금이 아무인 줄 나 몰라라.
꽃 피자 봄인 줄 알고
낙엽 지자 가을인 줄 알았도다.
산중에 책력 없어 계절 가는 줄 나 몰라라.
술에 취해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술 항아리 속에서 한 세계를 이루어 보자.
흙바닥에 잠을 자니 헌 누비 내 분수요,
질그릇에 마시는 술이 달콤하니
콩죽이 새로워라.
베옷 입고 거친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몸이 편안하다.
띠집에다 거처를 정하니
계수나무에 맑은 바람이 부는구나.
갈포건과 베옷에 명아주 지팡이 힘을 삼아
유흥을 못 이기여 솔 아래의 굽은 길로
하늘을 우러르고 긴 휘파람을 불며
마음대로 돌아가서
청산 어느 골에 돌길로 돌아오니
첩첩한 낭떠러지에 맑은 바람 쌓여 있고
검각 천 리에 흰 구름이 깊었도다.
지는 해 옅은 빛이 서왕모 요대 위에
산수 병풍 둘렀는 듯
푸르거든 희지 말고, 희거든 붉지 마소.
푸른 것은 청산이요, 흰 것은 백운이오.
붉은 것은 저녁노을이로다.
소나무에 기대서서 먼 산을 바라보니
거문고 가진 아이 술 그릇을 느슨히 메고
구름 속에 날 찾으니
적송자 온다는 말인가.
임화정이 아니면 소부와 허유로다.
이 밖에 제 뉘 와서 날 찾으리.
머리를 돌이켜서 솔 속으로 살펴보니
산중에 늙은 어른 오건을 젖혀 쓰고
푸른 옷 입은 아이들이 앞뒤로 둘러서서
잡거니 밀거니 두세 번째 오는구나.
돌 단에 마주 나와 팔 밀어 읍례하고
솔가지 손수 꺾어 푸른 이끼 쓸어치고
나이대로 앉으면서 기쁜 듯 반기는 듯
즐거움이 그지없다.
질그릇에 소자주를 박잔에 가득 부어
잡거니 권하거니 취하도록 먹은 후에
영영 우는 칠현금(七絃琴)을
정자에서 들으니
아름다운 산수곡을 역력히 알리로다.
인간의 먹은 귀가 오늘에야 열렸구나.
어와 마음 맞는 벗이로다.
종기를 기이하게 만났으니
<유수>를 연주한들 무엇이 부끄러우리.
산중에 뜻이 깊어 세상 일을 잊었으니
수수에 여윈 살이 취 줄기에 다 빠지겠다.
절벽에 달이 밝고 계곡에서 바람 들으니
흰 구름 속 깊은 곳에 자는 학 슬피 운다.
하늘은 높고 땅은 아득하니
우주가 무궁함을 깨닫겠고,
흥이 다하자 슬픔이 오니
성하고 쇠함이 운수인 줄 알겠노라.
예도 좋거니와 또 좋은 데 있느니라.
기약하고 가사이다.
봉래 방장 영주산에 모레로 가사이다.
곤륜산 북녘에 서왕모 찾아
글피에 가사이다.
넓은 하늘 구만 리는 거북 타고 가사이다.
망망 우주에서 정처 없이 버린 몸이
취하여 빈산 속에 지니
천지가 화려한 집이요,
소나무 잣나무가 이부자리로다.
두어라, 깊은 골과 높은 산의
주인 될까 하노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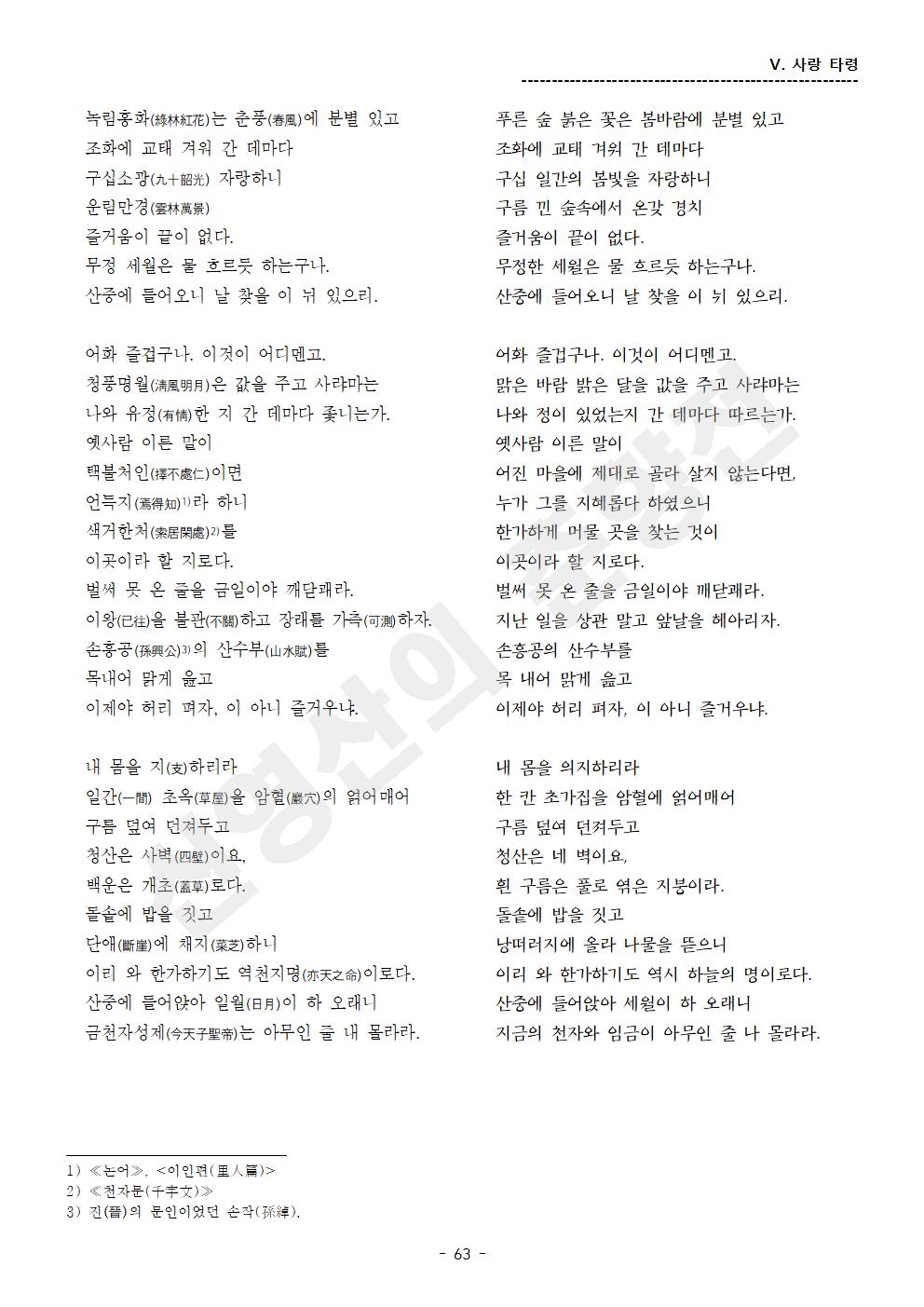



'고전총람(산문) > 남원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판)남원고사 - V. 사랑 타령 (4/4) (0) | 2020.06.24 |
|---|---|
| (경판)남원고사 - V. 사랑 타령 (3/4) (0) | 2020.06.24 |
| (경판)남원고사 - V. 사랑 타령 (1/4) (0) | 2020.06.23 |
| (경판)남원고사 - IV. 고운 치레 (3/3) (0) | 2020.06.23 |
